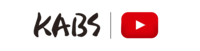Abstract
References
Sorry, not available.
Click the PDF button.
Information
The school of Seon(禪宗), especially the Seon of seeing the Gong-An(公案), asserts that the doubt of the Wha-Doo(話頭疑心/疑情) leads to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頓悟見性). There are two views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doubt of the Wha-Doo and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One view is that the mind that desires to know the unknown column creates the acquiring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 This view observes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 ‘doubt’. The other view is that the doubt of the Wha- Doo is a method for concentration that makes the mind not-divided. However, these two views are not a valid argument to explain the causal interrelation between the doubt of the Wha-Doo and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 .The beginning point of the Wha-Doo’s doubt is the ‘Not Knowing State of Mind’. From this point two kinds of the ‘Not Knowing State of Mind’ are able to come into being. One is the ‘Not Knowing State of Mind that Wants to Know’, the other is the ‘Only Not Knowing Mind’. Wha-Doo’s doubt is the ‘Only Not Knowing Mind’. The ‘Not Knowing State of Mind that Wants to Know’ always aims at discriminating knowledge. The individuals that practice with this kind of doubt necessarily falls into the ten illnesses of Wha-Doo(看話十種病).However, the Wha-Doo’s doubt must necessarily lead to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 which manifests the ‘Not Dividing Mind’(無分別知). Wha-Doo’s doubt must not be the kind of ‘Not Knowing Mind that Wants to Know’ but the ‘Only Not Knowing Mind that Never Desires a Prescribing Answer’.The doubt of Wha-Doo has the aspect of non-prescription.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is aspect of non-prescription to understand the causal interrelation between the doubt of the Wha-Doo and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 The ‘Only Not Knowing Mind that Never Desires a Prescribing Answer’ is the state of mind voluntarily denying the conceptual prescription.The seeker of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 is to take the aspect of a voluntarily non-prescribing state of mind in Wha-Doo and concentrate on it to acquire Sudden Enlightenment and Seeing Reality.
화두 의심의 출발점은 ‘모르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모르는 마음’ 에서 두 유형의 ‘모르는 마음 상태’가 분기될 수 있다. ‘알고자 하는 모르는 마음’과 ‘오직 모르는 마음’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길은 ‘알고자 하는 모르는 마음’인데, 화두 의심이 촉발시켜 주려는 것은 ‘오직 모르는 마음’이다.간화선 화두 참구법이 무분별지를 여는 돈오견성과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화두 의심은 ‘분별(앎/이해/답)을 겨냥하고 있는 모르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알고자 하 는 모르는 마음’은 ‘모름’을 부정하고 ‘앎’을 긍정하려는 마음이어서, 항상 앎/이해/답을 목표로 삼아 겨냥하고 있는 ‘모르는’ 마음이다. ‘특정한 분별 개념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확정하는’ 앎/이해/답을 갈 구하는 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심’은, 그 속성상 간화 십종병 으로 지칭되는 다양한 ‘앎/분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의심은 무분별지의 국면을 여는 돈오견성의 길에 반(反)하는, 반(反) 화두 의심이다.이에 비해 화두 의심의 그 ‘모르는 마음’이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인 ‘오직 모르는 마음’은, ‘앎/이해/답을 구하는 모르는 마음’이 아 니라, ‘앎/이해/답을 겨냥하지 않는 오직 모르는 마음’이다. 이 모르 는 마음은, 특정한 분별 개념적 내용으로 채우거나 확정하기를 자발 적으로 거부하는 마음 상태이다. 모든 분별 개념적 규정과 칸 지르 기를 거부하는 ‘자발적 무규정/불확정의 마음 상태’이다. 바로 이 ‘오 직 모르는 마음’이 화두 의심의 본령이라 생각한다.돈오견성/깨달음/해탈은 ‘분별적 규정(희론)’으로 인한 존재 왜곡 과 오염이 해소된 국면이다. 분별적 규정 습벽의 지배에서 해방되 어, 개념/언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환각에서 벗어나, 개 념으로 분류하고 지칭되는 존재들의 참 모습(실재)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게 된 국면이다.이러한 돈오견성/깨달음/해탈 국면을 열려면, 무시이래 뿌리 깊게 내면화된 ‘분별적 규정(분별지)의 습벽(업력)’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분별적 규정 습벽’에 휘말려들지 않는 ‘무규 정/불확정의 마음 상태’를 자발적으로 계발하고 수립해야 한다. 아 울러 수립된 이 ‘자발적 무규정/불확정의 마음 상태’를 순일하게 챙 겨가, ‘분별적 규정 습벽’에서 완전히 풀려나기에 충분한 정도의 힘 을 축적해야 한다.화두에서 촉발되는 ‘오직 모르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성격의 ‘자발 적 무규정/불확정의 마음 상태’이다. 간화선에서 역설하는 화두 의 심은 일체의 분별적 규정을 거부/해체하는 ‘규정하지 않는 모름’이 다. 앎/이해/답을 겨냥하여 구하지 않는 ‘오직 모름’이다. 이러한 의 심/의정을 의단(疑團)으로 발전시켜 오롯하게 챙겨감으로써, 중생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분별적 규정의 습벽(분별지의 업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간화선 화두 참구가 제창하는 돈오견성/깨달음/해탈 체계의 핵심 발상이다.
Click the PDF button.
- Publisher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 Publisher(Ko) :불교학연구회
- Journal Title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 Journal Title(Ko) :불교학연구
- Volume : 27
- Pages :155 ~ 211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