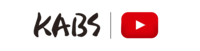About the KJBS
The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KJBS) has been published by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KABS) since December, 2000. It aims to promote Buddhist studies in South Korea and has been recognized as an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by Korean Citation Index system since 2015.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publishes academic papers and critical book reviews quarterly. All published papers go through double-blind peer reviews by three reviewers.
The editorial board of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encourages authors to submit academic research in all fields of Buddhist studies, ranging from philological, doctrinal, historical, cultural, methodological, and applied issues on both classical and modern aspects of Buddhism over different geographical area of South, Southeast, Central, and East Asia. It serves as a venue for Kore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and researchers to report their scholarly works and exchange up-to-date knowledge on diverse traditions of Buddhism.
Editor-in-Chief: Prof. Dr. Byung-Wook Lee, Joong-Ang Sangha University
Publishing model: Open Access
Publication Dates: March 31, June 30, September 30, December 31
ISSN: 15989-0642
-
특집논문
-
역사적 붓다의 본성에 대한 재고찰
-초기 불교 문헌을 완성된 전체로 파악하는 접근법에 입각하여-
The Historical Buddha Revisited: Interpreting Early Buddhist Texts as an Integrated Whole
-
김한상
KIM, Han-Sang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ute the so-called “deification theory of the Buddha” and to presen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
이 논문의 목적은 초기 불교 문헌에서 그려지는 붓다의 모습을 근대적 편견을 섞지 않고 텍스트에 입각한 형태 그대로 파악함으로써 이른바 ‘역사적 붓다의 신격화설’을 …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ute the so-called “deification theory of the Buddha” and to presen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Buddha by examining his image as portrayed in early Buddhist literature, free from modern biases. Instead of analyzing isolated suttas, this study approaches the early Buddhist texts as a unified whole in order to explore their overarching meaning and internal coherence. From this perspective, it becomes evident that early Buddhists emphasized the Buddha’s superhuman nature from the beginning, rather than focusing primarily on his human qualities. Following his enlightenment, the Buddha could no longer be classified as merely “human,” having perfected and transcended his humanity. This transcendence is reflected in the term “Tathāgata,” which the Buddha used to refer to himself, indicating that he surpassed ordinary human limitations. His mystical nature is further affirmed by scriptural references describing him as the one who embodies the dharma (dhamma-kāya) and as “the one who has become the dharma” (dhamma-bhūta).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the Buddha was perceived from the outset as a superhuman being, offering a new interpretive horizon for discussions on his deification.
- COLLAPSE
이 논문의 목적은 초기 불교 문헌에서 그려지는 붓다의 모습을 근대적 편견을 섞지 않고 텍스트에 입각한 형태 그대로 파악함으로써 이른바 ‘역사적 붓다의 신격화설’을 반박하고 붓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초기 불교 문헌을 일관된 전체로 분석하여 개별 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통일된 의미와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기 불교인들은 처음부터 붓다의 인간적 본성과 대조되는 붓다의 초인적 본성에 초점을 맞추었음이 분명하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불릴 수 없었는데, 이는 붓다가 자신의 인간성을 완성하고 초월했기 때문이다. 붓다가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여래(Tathāgata)’라는 용어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붓다의 초월성을 함축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붓다의 이러한 신비로운 본질은 붓다가 법을 몸으로 지닌 자(dhamma-kāya)이자, ‘법이 된 자(dhamma-bhūta)’로 규정될 수 있다는 성전 구절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붓다는 처음부터 초인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밝히고, 역사적 붓다의 신격화 논의에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역사적 붓다의 본성에 대한 재고찰
-초기 불교 문헌을 완성된 전체로 파악하는 접근법에 입각하여-
-
특집논문
-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했는가?
Does the Laṅkāvatārasūtra identify the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
김성철
KIM, Seong-Cheol
- The Laṅkāvatārasūtra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first text to identify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한 최초의 문헌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동일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다른 대답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
- The Laṅkāvatārasūtra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first text to identify tathāgatagarbha with ālayavijñāna. This paper offer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what the identification actually means.
To put it directly, the “identification” in the Laṅkāvatārasūtra is not a simple equation of the two concepts but rather a reinterpretation of the tathāgatagarbha concept from a Yogācāra standpoint. This reinterpretation reflects the Yogācāra perspective that tathāgatagarbha is a provisional teaching (neyārtha) grounded in skillful means (upāyakauśalya). To establish this point, the paper first considers the compositional intention of the Laṅkāvatārasūtra, noting its twofold standpoint—Mahāyānasaṃgraha and Saṃdhinirmocana—and then examines how the tathāgatagarbha concept is treated, particularly from the latter perspective.
In the sections where tathāgatagarbha is discussed independently, the Laṅkāvatāra Sūtra presents it as a concept taught with śūnyatā or tathatā in mind. These passage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later claims that the tathāgatagarbha doctrine is a provisional teaching. In the sections where tathāgatagarbha appears alongside ālayavijñāna, the central issue is what is the subject of saṃsāra. At this point, the tathāgatagarbha concept is meticulously reinterpreted as ālayavijñāna. In other words, what transmigrates from beginningless time until nirvāṇa is ālayavijñāna, and tathāgatagarbha functions only as a provisional teaching posited in reference to this ālayavijñāna.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uggests that, when we refrain from projecting the perspective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onto the Laṅkāvatārasūtra and instead interpret the text within the context of Indian Buddhist intellectual history, new horizons of interpretation become possible.
- COLLAPSE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한 최초의 문헌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동일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다른 대답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대답은 『능가경』에서의 ‘동일시’는 단순한 동일시가 아니라, 여래장 개념에 대한 유가행파 입장에 선 재해석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재해석은 여래장 개념이 방편설에 입각한 불요의설이라는 유가행파의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본고는 먼저 『능가경』의 찬술 의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것이 ‘섭대승’과 ‘해심밀’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특히 ‘해심밀’의 입장에서 여래장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단독으로 여래장이 다루어지는 부분에서 『능가경』은 그것을 공성 혹은 진여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개념이라고 한다. 이 구절들은 후대의 문헌에서 여래장사상이 방편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여래장이 알라야식과 나란히 등장하는 부분에서 핵심 문제의식은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여래장 개념은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쳐 알라야식으로 재해석된다. 다시 말해 무한한 과거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윤회하는 것은 알라야식이며, 여래장은 이러한 알라야식을 의도해서 설해진 방편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고의 결론은 『대승기신론』적 시각을 『능가경』에 역으로 투영하는 데서 벗어나, 인도불교 사상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
『능가경』은 여래장과 알라야식을 동일시했는가?
-
특집논문
-
선사상에 나타난 초목불성의 전개와 함의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Buddha-nature of Insentient Beings in Ch’an (Sŏn/Zen) Thought
-
마해륜
MA, Hae-Ryoon
- The theory of the Buddha-nature of insentient beings represents a distinctive development in the discourse on Buddha-nature within East Asia. This idea …
초목불성은 동아시아에서 특수한 형태로 전개된 불성 사상이다. 교학 전통에서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523-592)의 『대승의장』에서 불성을 능지성(能知性)과 소지성(所知性)으로 구분하고, 대상 세계에 존재하는 불성을 인정할 …
- The theory of the Buddha-nature of insentient beings represents a distinctive development in the discourse on Buddha-nature within East Asia. This idea was debated in the doctrinal traditions of the Sanlun, Tiantai, and Huayan schools. Its origins can be traced to Huiyuan (慧遠, 523–592) of Jingying Temple in the Dilun school, whose Dasheng Yizhang (大乘義章) articulated a distinction between Buddha-nature as “the nature of knowing” and “the nature of being known,” there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acknowledging Buddha-nature as existing within the objective world. In the Sanlun (三論) school’s Dasheng Xuanlun (大乘玄論), it was argued that once the Middle Way is realized, all sentient beings and even plants possess Buddha-nature and can achieve Buddhahood. This is not an ontological justification of Buddha-nature, but a paradoxical argument intended to deconstruct discriminative cognition that distinguishes between sentient and insentient beings and determines the presence or absence of Buddha-nature.
In Chan thought, numerous examples appear in the Northern school’s Lengqie Shizi Ji, where the Dharma teaching of insentient beings was employed as an unconventional Chan method to test students and guide them toward enlightenment. Guṇabhadra and Bodhidharma also made use of insentient Dharma teaching, which later developed into huatou. Daoxin employed the Buddha-nature of insentient beings as a means to overcome rigid scriptural interpretation, while Hongren described the realm of insentient beings as the dharma-body (境界法身), where the sphere of ālayavijñāna is realized. The Ox-head school taught that plants are beings originally united with the Dao (道) and capable of attaining Buddhahood, drawing on scriptures such as the Avataṃsaka Sūtra and the Vimalakīrti Sūtra for textual support.
The Ox-head school’s theory of the Buddha-nature of plants carried critical implications for the Buddha-nature debate, opposing the Southern school’s interpretations. It displayed a tendency to affirm both the “knowable nature” (所知性) and the “knowing nature” (能知性) of Buddha-nature. The attribution of the Buddha-nature of insentient beings to National Master Huizhong in the Zutangji (祖堂集) can be read as a narrative reflecting the Southern school’s internal perspective, which sought to criticize the extreme interpretations of Buddha-nature that had emerged within its own branches.
- COLLAPSE
초목불성은 동아시아에서 특수한 형태로 전개된 불성 사상이다. 교학 전통에서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523-592)의 『대승의장』에서 불성을 능지성(能知性)과 소지성(所知性)으로 구분하고, 대상 세계에 존재하는 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그 사상적 기원이다. 삼론종 『대승현론』에서는 제한적으로 초목불성을 인정했는데, 중도를 체득한 리내(理內)의 범주에서는 중생과 일체 초목도 모두 불성이 있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불성의 존재론적 정당화가 아니라 유정과 무정을 구분하고 불성의 유무를 가르는 분별을 해체하기 위한 역설적 논변이다. 기존에 선사상 연구에서 초목불성은 주로 우두종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도가적 자연관과 결합된 불성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종계 『능가사자기』에는 구나발다라와 보리달마에게 화두의 원초적 형태로 무정설법을 활용하여 학인의 경지를 점검하고 깨달음으로 유도하는 선법이 발견된다. 도신(道信)은 경전에 대한 고착적 이해를 극복하는 소재로 초목불성을 예시하고 있으며, 홍인(弘忍)은 무정의 세계를 아뢰야식이 실현된 경계법신(境界法身)으로 설명했다. 우두종은 초목이 본래 도와 합치된 존재로서 성불할 수 있다고 보았고 『화엄경』과 『유마경』과 같은 경전을 근거로 삼았다. 우두종의 초목불성은 남종의 불성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불성의 소지성(所知性)과 능지성(能知性)을 모두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조당집』에 서술된 혜충국사의 무정불성은 남종의 특정 분파에서 발생한 경도된 불성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서사로서 남종 내부의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선사상에 나타난 초목불성의 전개와 함의
-
특집논문
-
원효의 상위비량을 통한 법상유식 무성론 비판 연구
-규기의 무성유정 인명논증을 중심으로-
Wonhyo’s Critique of the Faxiang-Yogācāra Theory of No Buddha-nature through Contradictory Inference: A Focus on Kuiji’s Hetuvidyā Argument for Sentient Beings without Buddha-nature
-
김태수
KIM, Tae-Soo
- This paper examines Wonhyo (元曉, 617–686)’s Buddha-nature theor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Faxiang–Yogācāra school’s dualism of consciousness (識) and principle …
본 논문은 원효(元曉, 617-686)의 불성론을 법상유식학파의 식(識)과 리(理)의 이원론 및 무성중생설과 비교·고찰한다. 특히 원효가 상위비량(相違比量) 등을 통해 상대방의 오류를 비판하는 방법론적 특성에 …
- This paper examines Wonhyo (元曉, 617–686)’s Buddha-nature theor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Faxiang–Yogācāra school’s dualism of consciousness (識) and principle (理), along with its doctrine of sentient beings without Buddha-nature. Particular attention is devoted to Wonhyo’s methodological approach of criticizing opponents’ errors through contradictory inference (相違比量) and other logical methods, thereby exposing the fallacies inherent in the Faxiang–Yogācāra school’s theory of five distinct natures and its denial of Buddha-nature. The study analyzes Kuiji (窺基, 632–682)’s logical proof for the existence of sentient beings without Buddha-nature, as presented in his Essential Commentary on the Discourse on the Theory of Consciousness-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Dignāga’s three characteristics of reason (trairūpya) and classical logic, it reconstructs Wonhyo’s critical strategy against Kuiji’s argument. Following Wonhyo’s approach of exposing logical errors that arise when one becomes fixated on eithe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Buddha-na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rgumentative structures of both positions. Focusing in particular on sections 10 and 13 of the Critique of Inference, Wonhyo the paper analyzes the Faxiang–Yogācāra school’s doctrine of five distinct natures (五性各別說), the issue of icchantika (一闡提), and Wonhyo’s harmonizing interpretation of these problems. By demonstrating the limitations of Kuiji’s argument through the fallacy of contradictory reason with qualifications of the subject (有法差別相違因), which produces contradictory conclusions from the same premise, this study illuminates the logical foundation and philosophical character of Wonhyo’s “neither-being-nor-non-being” theory of Buddha-nature. Grounded in the doctrine of One Mind, this theory harmonizes the positions of Buddha-nature existence and non-existence.
- COLLAPSE
본 논문은 원효(元曉, 617-686)의 불성론을 법상유식학파의 식(識)과 리(理)의 이원론 및 무성중생설과 비교·고찰한다. 특히 원효가 상위비량(相違比量) 등을 통해 상대방의 오류를 비판하는 방법론적 특성에 주목하여, 법상유식학파의 오성각별설과 무성론이 지닌 논리적 오류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규기(窺基, 632-682)가 『성유식론장중추요』에서 제시한 무성중생 존재 증명의 인명논식을 디그나가의 인(因)의 삼상(三相)과 고전논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효의 비판 전략을 재구성한다. 원효는 『판비량론』 제13절 오성각별설 논의에서 유성론의 추론식에서도 부정인의 오류를 지적하며, 불성을 ‘유’나 ‘무’로 단정하는 양극단의 한계를 드러내고 비유비무 중도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성·무성 중 한 가지 입장에 고착할 때 발생하는 논리적 문제를 드러내는 원효의 전략에 따라 양측의 논증 구조를 검토한다. 특히 『판비량론』 제10절과 제13절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상유식학파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과 일천제(一闡提)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원효의 비판과 회통적 해석을 분석한다. 아울러 『무량수경종요』와 『십문화쟁론』 <불성유무문>에 나타난 원효의 유성론적 입장과 유성·무성 양측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원효의 불성론이 비판과 회통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임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원효가 동일한 인(因)으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는 규기의 유법차별상위인(有法差別相違因)의 오류를 드러내는 동시에, 일심 사상에 기반하여 유성과 무성을 회통하는 비유비무 불성론의 논리적 토대와 사상적 특징을 규명한다.
-
원효의 상위비량을 통한 법상유식 무성론 비판 연구
-규기의 무성유정 인명논증을 중심으로-
-
투고논문
-
불교 언어철학의 전개
-초기불교에서 『중론』까지-
The Development of Buddhist Philosophy of Language: From Early Buddhism to the Mūlamadhyamakakārikā
-
김귀옥
KIM, Kwie-Ok
- This study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Buddhist philosophy of language from Early Buddhism to Nāgārjuna’s Mūlamadhyamakakārikā, aiming to clarify its …
본 논문은 초기불교에서 『중론』에 이르기까지 불교 언어철학의 사상 전개를 추적하고, 그 철학적 구조와 사유의 연속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불교에서 붓다는 언어의 …
- This study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Buddhist philosophy of language from Early Buddhism to Nāgārjuna’s Mūlamadhyamakakārikā, aiming to clarify its philosophical structure and continuity of thought. In Early Buddhism, the Buddha warned against the reification of language and, by responding to metaphysical questions with silence or avyākṛta (undetermined answers), revealed both the limitations and the skillful use of language. This approach dismantles attachment to ultimate reality while providing an ethical and practical orientation for the proper application of language. The Abhidharma schools systematized this awareness, engaging in theoretical debates over whether language exists independently or is conditionally constructed. Madhyamaka philosophy, particularly as articulated by Nāgārjuna, rejects any intrinsic nature (svabhāva) of language and maintains that it arises only provisionally within dependent origination, thereby presenting both its deconstructive function and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toward liberati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Buddhist view of language is not confined to epistemological inquiry or critique but emerges from a tradition that reconsiders language in the context of practice and liberation. This development unfolds through two central structures: “upāya-based language grounded in emptiness” and the “dependent origination of meaning.” Together, these reveal the conditional nature of language and its capacity for both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hese perspectives also establish a basis for dialogue with contemporary philosophy of language, linking ancient Buddhist insights with modern linguistic and hermeneutic discourse.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explore how the Buddhist philosophy of language—its orientation of thought and its understanding of existence—can be newly illuminated and expanded within modern philosophical traditions, enabling deeper dialogue that transcends temporal and cultural boundaries while bridging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ies.
- COLLAPSE
본 논문은 초기불교에서 『중론』에 이르기까지 불교 언어철학의 사상 전개를 추적하고, 그 철학적 구조와 사유의 연속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불교에서 붓다는 언어의 실체화를 경계하며,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기(無記)로 대응함으로써 언어의 한계와 방편적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러한 언어관은 실재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는 동시에,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윤리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파불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독립적으로 실재하는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논쟁을 전개하였다. 중관사상, 특히 용수는 언어의 자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언어가 연기적 조건 속에서만 가설적으로 성립한다는 입장을 통해 언어 해체와 해탈을 향한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불교의 언어관이 단순한 인식론적 논의나 언어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과 해탈의 관점에서 언어를 재사유하는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개는 ‘공에 기반한 방편적 언어’와 ‘연기적 의미 생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언어의 조건적 성립과 그 해체·재구성의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는 현대 철학의 언어 논의와도 대화의 가능성을 지니며, 고대 불교의 사유가 현대의 언어철학·해석학적 논의와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불교 언어관이 지닌 사유의 방향과 존재 이해의 특성이 현대 철학 전통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조명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규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언어적 사유가 시대와 지역을 넘어, 동서 철학을 가로지르는 심층적 대화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교 언어철학의 전개
-초기불교에서 『중론』까지-
-
투고논문
-
물리적 대상만이 공간을 점유하는가?
-유가행 유식학파 철학에서 공간성의 문제 재검토-
Do Only Physical Objects Occupy Space?: Reassessing Spatial Location in Yogācāra Philosophy
-
이길산
LEE, Gil-San
- The modern commentator Mark Siderits argues that in the second verse of the Viṃśikā (Twenty Verses), Vasubandhu’s opponent, who criticizes idealism on …
현대의 주석가 마크 시더리츠는 『유식이십론』 제2송에서 바수반두의 논적이 공간적 한정성에 기반해 관념론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논변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
- The modern commentator Mark Siderits argues that in the second verse of the Viṃśikā (Twenty Verses), Vasubandhu’s opponent, who criticizes idealism on the basis of spatial limitation, commits the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 This is because, by presupposing spatiality, the opponent implicitly affirms the existence of physical matter, the very point under dispute. However, the claim that the existence of mind-independent objects can be inferred from the premise that only physical entities occupy spatial locations seems to be a position unique to Vasubandhu, rather than a reflection of broader philosophical currents of his time. If this is the case, Vasubandhu may have committed a significant philosophical error. Nevertheless, given the intellectual context of Vasubandhu’s era, it may be overly demanding to expect a firm commitment to the premise that “only physical objects can have spatial location.” The view that Siderits treats as a common-sense intuition appears to have gained serious traction only in later stages of the Yogācāra tradition, particularly in thinkers such as Sthiramati. This development can be understood either as an internal deepening of the doctrine of vijñaptimātratā or as the result of external influences, such as the impact of Jain philosophical thought.
- COLLAPSE
현대의 주석가 마크 시더리츠는 『유식이십론』 제2송에서 바수반두의 논적이 공간적 한정성에 기반해 관념론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논변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직 물질만이 공간적인 위치를 갖기 때문에, 대론자가 자신의 논변에서 공간성을 전제하는 순간 논의의 주제인 물질의 존재 또한 함축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간적 한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유로 인식 독립적인 대상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저 논변은 당대 특정한 철학적 조류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바수반두 자신이 창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바수반두는 여기서 철학적 실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수반두 당대의 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직 물리적 대상들만이 공간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일 수 있다. 시더리츠가 상식적으로 요구했던 ‘물질만이 공간적인 위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스티라마띠와 같은 상당히 후대의 유가행파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유식무경 아이디어의 내적인 철저화로도 설명될 수 있고, 혹은 자이나교의 사상의 영향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물리적 대상만이 공간을 점유하는가?
-유가행 유식학파 철학에서 공간성의 문제 재검토-
-
투고논문
-
『대승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 연구
A Study on the Metaphor of Water, Wind, and Waves i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
강준모
KANG, Jun-Mo
- This study examines the 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ter, wind, and waves metaphor i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승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의 관련 용례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는 『능가경』에서 온 …
- This study examines the 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ter, wind, and waves metaphor i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AFM). Traditionally, this metaphor has been considered to originate from the Laṅkāvatāra Sūtra, but its appearances in other text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employs slice similarity analysis to identify occurrences of the metaphor, organize them into recurring patterns in texts predating AFM, and compare these with its usage in AFM.
The research corpus consists of 2,000 digitized volumes from the CBETA collection. Within this corpus, instances of the key metaphors “water,” “wind,” and “waves” were identified through slice similarity analysi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se metaphors serve three primary functions: as natural descriptions, as representations of psychological states, and as components of philosophical arguments. A comparison with earlier texts reveals that the metaphor in AFM shares the perspective of affirming the mind’s immutable nature, as found in the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and the Laṅkāvatāra Sūtra. Its argumentative structure also shows affinities with the Mahāparinirvāṇa Sūtr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it demonstrates that large-scale Buddhist textual corpora can be effectively analyzed using rule-based computational methods, in particular slice similarity analysis. Second, it identifies pre-AFM uses of the metaphor and shows that its psychological applications fall into two distinct categories. Third, it suggests that the metaphor in AFM may share conceptual and doctrinal affinities not only with the Laṅkāvatāra Sūtra but also with earlier scriptures such as the Mahāparinirvāṇa Sūtra.
- COLLAPSE
본 연구의 목적은 『대승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의 관련 용례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는 『능가경』에서 온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다른 문헌에서의 활용 양상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슬라이스 유사도 분석을 활용하여 『기신론』 이전 문헌들에서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가 사용된 사례를 찾고, 나타나는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한 뒤, 이를 『기신론』의 비유와 비교하였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CBETA에 수록된 2000여 권에 달하는 전산화된 한문 불전을 대상으로, 슬라이스 유사도 분석을 활용하여 물, 바람, 파도의 비유를 검출하였다. 그다음으로 검출된 내용들을 용도에 따라 자연 묘사, 심리 현상에 대한 비유, 그리고 철학적 논변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를 앞선 비유들과 비교하여, 『기신론』의 비유는 『대지도론』, 『능가경』과 같이 마음의 불변하는 성질을 긍정하는 시각에서 사용되었으나 논의 전개상으로는 『열반경』과 공유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한문 불전에 규칙 기반의 전산언어학적 도구인 슬라이스 유사도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자료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둘째, 『기신론』 이전에 사용되었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들이 심리 묘사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기신론』의 비유를 다른 문헌들의 용례와 유사성을 비교하여, 『기신론』이 『열반경』 등의 『능가경』 이전의 문헌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대승기신론』의 물과 바람과 파도의 비유 연구
-
투고논문
-
“무대 위의 꼭두각시를 보라”
-임제의 삼구·삼현·삼요와 동산의 삼로를 중심으로-
“Look at the puppets on the stage”: A Focus on Linji’s Three Phrases, Three Marvelous, Three Essentials and Dongshan’s Three Ways
-
허 진 · 박대용(동광)
HEU, Jin · PARK, Dae-Yong (Ven. Dong-Kwang)
- Linji (?–867) and Dongshan (807–869), who lived during the same period, bot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Josaseon tradition, yet it is …
동시대에 출현한 임제 의현(?~867)과 동산 양개(807~869)는 모두 조사선의 기틀을 확립하였지만 그들이 펼친 방편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즉 임제는 삼구·삼현·삼요를 주장하였으며, …
- Linji (?–867) and Dongshan (807–869), who lived during the same period, bot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Josaseon tradition, yet it is well known that their methods differed. Linji emphasized the Three Phrases, Three Marvelous, and Three Essentials, while Dongshan stressed the Three Paths. This study therefore compares and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styles they advocated, leading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terms of practice and enlightenment methods, the Seon masters expressed their approaches through distinctive styles, scoring systems, student cultivation methods, and teachings. Linji emphasized the radical freedom and unbounded human image of Hal, while Dongshan advanced a method centered on inner reflection and contemplation of the self.
Second, Linji’s Three Phrases highlighted intuitive and immediate enlightenment, emphasizing practice that transcends the limits of language. In contrast, Dongshan’s Samro developed a gradual approach. Within Samro, Jodo symbolizes liberation from all bonds, like a bird flying freely in the sky; Hyeonro expresses enlightenment that surpasses logic and language; and Jeonsu signifies experiencing enlightenment and then spreading it outward. Dongshan’s teachings of internal reflection based on Samro stressed putting enlightenment into daily practice through gradual cultivation.
In conclusion, by comparing Linji’s Three Phrases with Dongshan’s Three Paths, this study achieves a more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how their Seon ideologies were realized and how they unified students through differing methods of practice.
- COLLAPSE
동시대에 출현한 임제 의현(?~867)과 동산 양개(807~869)는 모두 조사선의 기틀을 확립하였지만 그들이 펼친 방편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즉 임제는 삼구·삼현·삼요를 주장하였으며, 동산은 삼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본 연구에서 이들이 주장한 가풍의 상통점과 상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선사들의 수행 과정과 돈오 방식에 따라 그들의 점수과정과 가풍, 제접법과 가르침 등은 다양한 형식과 방편으로 나타났다. 임제는 할과 같은 과격한 형식과 자유로운 인간상을 강조하였고 동산은 내면을 관조하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임제의 삼구·삼현·삼요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며,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것은 언어 한계를 초월한 수행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산의 삼로에서 조도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모든 속박을 벗어난 해탈을 나타내며, 현로는 논리와 언어를 넘어선 깨달음을 표현하고, 전수는 깨달음을 체험한 후 이를 외부로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동산은 삼로를 바탕으로 내적 성찰의 가르침을 전개하였고 점진적 수행을 통해 일상의 삶속에서 실천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임제의 삼구·삼현·삼요와 동산의 삼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선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었으며, 각기 다른 수행 방편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학인들을 제접하였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무대 위의 꼭두각시를 보라”
-임제의 삼구·삼현·삼요와 동산의 삼로를 중심으로-
-
투고논문
-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현장(玄奘)의 학문적 위상
Xuanzang’s Scholarly Status as Reflected in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Commentary
-
백진순
BAEK, Jin-Soon
- One of Xuanzang’s most significant scholarly achievements was his complete translation and exposition of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Through this work, he not …
현장의 중요한 학문적 업적 중 하나는, 『유가론』 전권의 번역과 강설을 통해서 『유가론』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 부분인 논리학[因明] 연구의 열풍을 선도한 것이다. 이러한 …
- One of Xuanzang’s most significant scholarly achievements was his complete translation and exposition of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Through this work, he not only deepened understanding of the text but also stimulated scholarly interest in Buddhist logic (Hetuvidyā), a branch of Yogācāra philosophy. This influence is known primarily through indirect accounts transmitted by the first-generation scholars of the Yogācārabhūmi-Śāstra.
This paper examines Xuanzang’s intellectual standing by analyzing Dunlun’s Yogācārabhūmi Commentary (瑜伽論記), which consolidates earlier scholarly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wo representative examples from the section “Saṅgraha-prayukta-vibhāga” (攝決擇分), revealing Xuanzang’s methodological depth.
The first concerns his interpretation of the Five Types of Natures. The concept of “no-nature”—which posits the existence of beings without the potential for enlightenment—provoked prolonged controversy among Tang dynasty monks. Xuanzang offered two distinct explanations. According to him, “no-nature” may refer either to a bodhisattva who possesses the potential for Buddhahood but chooses not to enter nirvāṇa in order to save sentient beings, as described in the Laṅkāvatāra Sūtra; or to an individual who inherently lacks the capacity for nirvāṇa, as explained in the Mahāyāna-sūtrālaṅkāra, and thus cannot attain Buddhahood even under favorable conditions. This interpretation has continued to shape subsequent Buddhist discourse on “no-nature.”
The second example is Xuanzang’s application of vijñaptimātra inference. As presented in the Commentary, this inference occupies a circumscribed role within Yogācāra teachings grounded in ālaya-vijñāna. Xuanzang’s argument indirectly affirms the existence of ālaya-vijñāna through an epistemological proposition: when discriminative cognition of a visual object arises, ālaya-vijñāna and manas simultaneously generate awareness of the world of vessels, the body, and the self. This demonstrates that all dharmas are inseparable from consciousness. In particular, Xuanzang challenges the Hīnayāna position by asserting that a visual object perceived by visual consciousness cannot exist independently of that consciousness—thereby firmly establishing his vijñaptimātra inference.
- COLLAPSE
현장의 중요한 학문적 업적 중 하나는, 『유가론』 전권의 번역과 강설을 통해서 『유가론』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 부분인 논리학[因明] 연구의 열풍을 선도한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업적은 제1세대 『유가론』 연구자들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해진다. 본고에서는 선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유가론기』에 의거해서 현장의 학문적 위상을 추측해 보았다. 특히 「섭결택분」에서 두 개의 인용문을 택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첫째는 오종성(五種性)의 학설이다. 이것은 무종성(無種性)을 상정하기 때문에 당대 학승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문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화두를 남겨놓았다. 그에 따르면, 『유가론』의 ‘끝내 열반의 장애를 가진 자’란 『능가경』의 ‘보살천제(菩薩闡提)’처럼 실은 종성이 있는 자[有性]임에도 끝내 열반에 들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혹은 『대장엄론』의 ‘필경무열반법(畢竟無涅槃法)’처럼 항상 종성이 없는 자[無性]이므로 끝내 성불하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 이것은 후대에 무종성의 문제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단골 소재가 되었다. 둘째는 현장의 유식비량(唯識比量)이다. 『유가론기』에 따르면, 아뢰야식에 의거하는 유식의 교설 안에서는 그것은 제한적 의미만 갖는다. 그것은 특히 ‘아뢰야식의 존재’를 우회적으로 성립시키는 어떤 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논제에 따르면, 안식(眼識) 등이 색(色) 등의 경계를 요별하는 작용을 일으켰다면, 그와 동시에 아뢰야식과 말나식은 기세계·신체 및 ‘아’를 요별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해서, ‘일체법은 식과 분리되지 않음’을 성립시키는 논증을 시도한다. 이중, 소승을 대론자로 하여, ‘색을 요별하는 안식이 일어났을 때 그 색은 안식과 분리되지 않음’을 성립시킨 것이 바로 현장의 유식비량이다.
-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현장(玄奘)의 학문적 위상
-
투고논문
-
고려 사경(寫經), 젠더로 읽다
-『묘법연화경』 사경으로 본 여성의 성불과 좌절-
A Gendered Reading of Koryŏ Sutra Transcriptions: Women’s Enlightenment and Despair in Illustrated Lotus Sutra Manuscripts
-
이승혜
LEE, Seunghye
- The Lotus Sutra, one of the early Mahayana Buddhist scriptures addressing the possibility of women’s enlightenment,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across East …
이 논문은 고려 후기 『법화경(法華經)』 사경(寫經)을 젠더 관점에서 다시 읽는 연구이다. 『법화경』은 여성의 성불(成佛) 가능성에 대해 논한 여러 불교 경전 중 동아시아에 …
- The Lotus Sutra, one of the early Mahayana Buddhist scriptures addressing the possibility of women’s enlightenment,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across East Asia and was highly valued, constituting the majority of surviving late Koryŏ sutra transcriptions. The “Devadatta” chapter of the Lotus Sutra declares that women’s bodies are inherently obstructed by the five hindrances and therefore cannot attain Buddhahood, yet the Dragon Girl transforms into a male and quickly achieves enlightenment. Since the 1980s, Buddhist studies and feminist scholarship have critically examined the doctrine of women’s enlightenment in the Lotus Sutra and its unfolding within Korean Buddhist tradition. In contrast, art historical scholarship has largely evaluated late Koryŏ Lotus Sutra transcriptions as masterpieces of Buddhist art, emphasizing the devotee’s piety and the artisan’s skill.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utra manuscript as a complex image-text in which scripture, frontispieces, and dedicatory inscriptions coexist on a single plane, reflecting religious and cultural practices shaped by a gendered social structure. Focusing on the illuminated Lotus Sutra in seven volumes held at the Leeum Museum of Art, the study analyzes how late Koryŏ women internalized gendered doctrines. As a complete set with a frontispiece in each volume and a dedicatory inscription by a female patron in the seventh, the Leeum Lotus Sutra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how visual and textual representations of women’s enlightenment may have shaped lay women’s perceptions of Buddhahood. Finally, the inscription expressing the wish to be reborn as a male is reinterpreted in light of the social trauma and historical reality of Koryŏ women sent as tribute brides during the Yuan Interregnum. In this way, the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female agency in premodern Korean art history and Buddhist art studies.
- COLLAPSE
이 논문은 고려 후기 『법화경(法華經)』 사경(寫經)을 젠더 관점에서 다시 읽는 연구이다. 『법화경』은 여성의 성불(成佛) 가능성에 대해 논한 여러 불교 경전 중 동아시아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경전으로, 현존하는 고려 후기 사경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시되었다. 『법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에서는 여성의 몸에는 오장(五障)이 있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용왕의 딸인 용녀는 남성으로 변신해 빨리 불도를 이루었다고 설한다. 1980년대 이래 불교학계와 여성학계에서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법화경』의 여성성불론과 그 한국적 전개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왔다. 반면, 미술사학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고려 후기 『법화경』 사경은 발원자의 지극한 신앙심과 장인의 공교한 역량이 빚어낸 불교미술의 정수로 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사경을 경문, 변상도(變相圖), 발원문(發願文)이 하나의 평면에 공존하는 복합적인 텍스트이자, 젠더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탄생한 종교문화적 산물로서 접근한다. 특히 신자료인 리움미술관 소장 감지금자 『묘법연화경』 7권본을 중심으로 고려 후기 여성들이 젠더 차별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한 양상을 분석한다. 이 사경은 전체 7권이 모두 전하는 완본이자, 권마다 변상도가 있으며, 권7 말미에 여성 공덕주(功德主)가 남긴 발원문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변상도와 발원문의 종합적인 고찰은 경전의 교리와 시각적 재현이 균열하고, 여성 성불의 도상이 현실 속 고려의 여성 재가 신자들의 성불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자로 변성하길 희구한 여성의 발원문에 담긴 함의를 원나라가 고려에 공녀(貢女)를 요구했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트라우마에 비추어 재해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근대 한국미술사와 불교미술사 서술에서 간과된 여성 주체에 관한 논의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려 사경(寫經), 젠더로 읽다
-『묘법연화경』 사경으로 본 여성의 성불과 좌절-
-
투고논문
-
초기 유가사 수행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가능성 모색
-『수행도지경』을 중심으로-
Investigating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Early Yogācāra Practice for Trauma Healing: A Focus on the Path to Liberation Sūtra
-
조인숙
CHO, In-Sug
- This study explores the therapeutic relevance of the Path to Liberation Sūtra (Xiuxing Daodi Jing, 修行道地經), a foundational text of …
본 연구는 유가행파 수행 체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수행도지경』(이하 『경』을 중심으로, 그 수행법이 현대 심리치료, 특히 트라우마 치유에 어떻게 적용될 수 …
- This study explores the therapeutic relevance of the Path to Liberation Sūtra (Xiuxing Daodi Jing, 修行道地經), a foundational text of early Yogācāra, in the context of modern trauma recovery. With increasing r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xiety, and depressio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integrative healing models that bridge ancient contemplative traditions with modern psychology.
The sūtra presents a structured meditation path—including deconstruction of the five aggregates, mindfulness of breathing (ānāpānasmṛti), compassion meditation, and contemplation of emptiness—that closely parallels the stages of trauma healing: awareness, stabilization, and integration. These practices foster emotional regulation, cognitive flexibility, and somatic awareness, while also facilitating the transformation of deeply held beliefs and identity structures.
Key Yogācāra concepts such as ālayavijñāna (storehouse consciousness) and parāvṛtti (transformation of the basis) resonate with contemporary theories of memory reconsolidation, suggesting a psychological mechanism through which trauma-related imprints may be restructured.
This study argues that the Path to Liberation Sūtra provides not only a philosophical framework but also practical methods directly relevant to trauma-informed contemplative therapy. It offers insight into how Buddhist meditative systems can inform integrative approaches to psychological healing, rooted in both inner transformation and embodied awareness.
- COLLAPSE
본 연구는 유가행파 수행 체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수행도지경』(이하 『경』을 중심으로, 그 수행법이 현대 심리치료, 특히 트라우마 치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는 반복되는 재난과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우울 등 심리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치유 접근이 요구된다. 『경』에 제시된 오온 해체, 수식관, 자비관, 공관 등의 수행은 심리적 자동반응의 자각과 해체, 정서 회복, 자기 인식 구조의 재편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의 각 단계와 밀접하게 대응된다. 유식학의 아뢰야식과 전의(轉依) 개념은 기억 재구조화 이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고착된 반응 양식을 근원적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공관 수행은 존재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자기상을 해체하고, 감정·신념·기억의 통합적 전환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이 『경』의 수행 체계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통합적 심신 치유 모델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전통 명상법의 현대 임상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
-
초기 유가사 수행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가능성 모색
-『수행도지경』을 중심으로-
-
투고논문
-
인성교육 주체 간 신뢰회복의 중요성
-『대승기신론』의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The Importance of Restoring Trust Among Stakeholders in Character Education: The Practice System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
권선향 · 정은희 · 은정희
KWON, Sun-Hyang · JEONG, Eun-Hee · EUN, Chung-Hee
- In contemporary educational settings, the erosion of mutual trust among key stakeholders—teachers, students, and parents—has critically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
오늘날 교육 현장은 교육 주체 간의 신뢰 붕괴로 인해 인성교육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관계 단절과 상호 불신은 …
- In contemporary educational settings, the erosion of mutual trust among key stakeholders—teachers, students, and parents—has critically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The breakdown of relationships and the rise of distrust within the school community obstruct the cultivation of authentic character and contribute to the disintegration of educational cohes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ilosophical framework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Dasheng Qixin Lun) as a possible response to this crisis. The text presents a systematic model in which the originally pure mind becomes obscured by ignorance but regains its clarity through practice rooted in faith (信). Central to this model are the concepts of balsim (發心, the initial arousing of the mind toward enlightenment), the Fourfold Faith (四信), the and Five Practices (五行), which together offer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restoration of trust within character educa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actice-oriented system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and applies it to modern educational contexts, aiming to revitalize learners’ self-reflec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mutual trust between educators and students. The study emphasizes that when faith is cultivated through concrete practice, it becomes a steadfast foundation for moral agency. Drawing upon this philosophical tradition, the study proposes a practical, trust-centered model for character education designed to counteract the relational disintegration prevalent in today’s schools. Ultimately, it seeks to reposition education as a communal and transformative undertaking, grounded in ethical self-cultivation and collective growth.
- COLLAPSE
오늘날 교육 현장은 교육 주체 간의 신뢰 붕괴로 인해 인성교육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관계 단절과 상호 불신은 교육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본연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타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내면적 역량의 결핍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대안으로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논서인 『대승기신론』의 수행체계에 주목한다. 『대승기신론』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지만 무명으로 인해 번뇌에 빠지게 되며, 이를 ‘믿음[信]’에 기반한 수행을 통해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수행의 출발점이자 실천의 핵심인 ‘발심(發心)’, 초심자를 위한 실천 지침인 ‘사신(四信)’과 ‘오행(五行)’은 오늘날 인성교육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행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 교육의 맥락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내면 성찰과 자기 주도성 회복, 그리고 교육자와 학습자 간 상호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믿음이 실천을 통해 성숙될 때 퇴전하지 않는 신심(信心)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인성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승기신론』의 수행 사상을 바탕으로, 경쟁과 불신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교육이 다시금 공동체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철학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
인성교육 주체 간 신뢰회복의 중요성
-『대승기신론』의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
특별논문
-
불성의 형이상학
The Metaphysics of Buddha-Nature
-
홍창성
HONG, Chang-Seong
- The traditional concept of Buddha-Nature faces insurmountable metaphysical problems. I propose a second-order designator approach to Buddha-Nature to avoid its conceptual difficulties …
불성의 전통적 개념은 극복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직면한다. 필자는 그런 개념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불성의 개념을 여전히 불교 수행과 통합하기 위해 불성을 …
- The traditional concept of Buddha-Nature faces insurmountable metaphysical problems. I propose a second-order designator approach to Buddha-Nature to avoid its conceptual difficulties and to still incorporate its concept into Buddhist practices.
Buddha-Nature, which supposedly has an immutable self-nature, is either a substance or not. If Buddha-Nature is a substance, it is either a composite or a simple. If it is a composite, Buddha-Nature is a whole made of two parts, substrate and property. Since a whole is not real, Buddha-Nature is then an unreal fictional entity. If Buddha-Nature is a simple, it is either a substrate or a simple property. The existence of substrates is highly controversial in philosophy. If Buddha-Nature is a simple property, it cannot be specifically located anywhere within the body of a sentient being. Even if its spatiotemporal coordinate could somehow be identified, Buddha-Nature would only form a four-dimensional whole and thus become a fiction. Buddha-Nature should not be said to come into and go out of existence every instant, either, because this possibility contradicts the supposed immutability of Buddha-Nature.
Can these difficulties be avoided if Buddha-Nature is to be identified with emptiness? Is Buddha-Nature in fact identical with emptiness? If they are either identical with or distinct from each other, both must be real and independent existents. They should be substances. The hypostatization of emptiness, however, results in a paradox. One can interpret the concept of emptiness in such a way that it only means that things are empty of self-nature. But if Buddha-Nature is devoid of self-nature, it cannot be Buddha-Nature. If Buddha-Nature is not empty, however, it cannot bring about any change. In that case, it cannot make enlightenment realized and hence cannot qualify as Buddha-Nature. Empty or not empty, the existence of Buddha-Nature is denied. On the other hand, Buddha-Nature is not brought about by conditions. Nor can it arise out of itself. It cannot be said to exist from beginningless time. Buddha-Nature is not a substance.
Although Buddha-Nature is not real, it can be used conveniently as a fiction or a designator. We name things pens regardless of their colors, material bases, shapes, sizes, and weights as long as we can use them to write or draw. The entire variety of machinery and devices are all engines if they convert chemical energy into kinetic energy. Such common nouns as “pen” and “engine” are convenient designators each of which refers to a different object, on a given occasion, that performs its functional role as a pen or an engine. What exists in each of these occasions is a particular pen or engine, not an abstract entity such as Plato’s Forms.
There must exist a particular mental and/or physical state that is optimal for a given sentient being to achieve enlightenment at a specific location and time. We can use the term “Buddha-Nature” as a convenient designator to refer to such a mental and/or physical state that best suits a given Buddhist practitioner’s enlightenment in each case. Buddha-Nature, referred to this way, cannot be a substance that has a self-nature common to all sentient beings. The optimal psychophysical state is different in each sentient being, and the state changes constantly even in one sentient being over time. Buddha-Nature, understood as a fictional entity or a convenient designator, is free of the metaphysical problems that a substantive view of Buddha-Nature faces. Buddha-Nature still exists everywhere in our ordinary lives and Buddhist practices.
- COLLAPSE
불성의 전통적 개념은 극복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직면한다. 필자는 그런 개념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불성의 개념을 여전히 불교 수행과 통합하기 위해 불성을 2차 지시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불성은 고정불변의 자성을 가진 실체거나 실체가 아니다. 불성이 실체면 집합체거나 단순체이다. 집합체면 기체와 속성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되어 실재하지 않는 허구다. 단순체면 기체거나 단순 속성이다. 기체의 존재는 철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불성이 단순 속성이면 신체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특정할 수 없다. 설혹 그런 시공간이 존재하더라도 불성은 계속되는 시공의 부분들이 모인 4차원적 전체를 형성하여 허구가 된다. 그렇다고 불성이 찰나마다 생멸한다고 보면 고정불변하다는 불성의 정의에 어긋난다. 불성이 공과 동일하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불성이 실제로 공과 동일할까? 동일하거나 별개라면 둘 다 실재하는 독립적 존재, 즉 실체여야 한다. 그러나 공을 실체로 보면 패러독스에 빠진다. 공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불성에 자성이 비어있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데 불성이 공하다면 불성일 수 없다. 또 불성이 공하지 않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 불성에 의한 깨달음이 불가능하여 불성이 아니게 된다. 공하든 공하지 않든, 불성은 그 존재가 부정된다. 한편, 실체로서의 불성은 조건에 의해 성립할 수 없고 스스로부터 나올 수도 없다. 무시 이래로 존재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 불성은 실체가 아니다. 불성이 실재하지 않아도 불성은 가명 또는 지시어의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펜인데, 우리는 색깔과 재질, 모양, 크기, 그리고 무게가 다양한 펜을 각각 편리하게 모두 “펜”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며 사용한다. 물리적으로 다른 기계장치도 그것이 화학에너지를 물리에너지로 변환시키면 하나하나 모두 “엔진”으로 지칭된다. 보통명사 “펜”과 “엔진” 같은 것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경우마다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편리한 지시어다. 이때 존재하는 것은 구체적인 펜이나 엔진이지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추상적 대상이 아니다. 어느 한 유정물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심신의 특정 상태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불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깨달음을 이루기에 적절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편리하게 가리키는 지시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칭되는 불성은 모든 유정물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자성을 가진 실체일 수 없다. 각각의 유정물에 따라 그 상태가 다를 것이고, 또 한 유정물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상태가 끊임없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명으로 이해된 불성은 실체로서의 불성이 가진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우리 일상과 수행의 현장에 두루 존재한다.
-
불성의 형이상학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