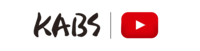-
투고논문
-
연기설에 나타난 ‘중도’에 대한 고찰
- 남북전의 비교를 통하여 -
The “Middle Way” in Paṭiccasamuppāda: A North–South Comparative Study
-
이은정
LEE, Eun-Jung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of right view (sammā-diṭṭhi) in relation to the wisdom of vipassanā, as reflected in the …
본 연구는 남전의 연기설에서 제시된 ‘중’의 의미를 고찰하고, 위빠사나의 지혜와 관련하여 바른 견해가 지닌 인식론적 함의에 주목하여, 수행론적 관점에서 실천적 차원의 ‘중도’라는 …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of right view (sammā-diṭṭhi) in relation to the wisdom of vipassanā, as reflected in the concept of “the Middle” (majjha) presented in the Pāli doctrine of paṭiccasamuppāda (dependent origination). It further aims to clarify the soteriolog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Middle Way from both doctrinal and meditative perspectives.
The Hojoryok (互照錄) serves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a comparative analysis of corresponding discourses in the Southern Pāli Nidāna-saṃyutta and the Northern Chinese Saṃyukta Āgama. Selected passages were also cross-examined with Sanskrit materials identified in Tripathi’s research.
The Middle Way between pleasure and pain avoids the two extremes of sensual indulgence and self-mortification and is identified with the Noble Eightfold Path. By contrast, within the doctrine of paṭiccasamuppāda, several forms of the Middle Way are presented, including the Middle Way between being and non-being, the Middle Way between sameness and difference, and the Middle Way between eternity and extinction. In the Southern tradition, only the Middle Way between pleasure and pain is explicitly designated as majjhimāpaṭipadā, whereas the others are expressed using the term majjhena.
Particular attention in the Southern tradition is given to the Middle Way of being and non-being, in which right view functions as the avoidance of the two extremes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The arising of right view corresponds to the process of cognitive perception itself, and through the wisdom cultivated in vipassanā, right view is fully realized. Structured through the seven stages of purification (satta-visuddhi), which also constitute the framework of vipassanā meditation, right view thus serves both as the foundation and the fruition of practice, leading to paññāvimutti-phala.
- COLLAPSE
본 연구는 남전의 연기설에서 제시된 ‘중’의 의미를 고찰하고, 위빠사나의 지혜와 관련하여 바른 견해가 지닌 인식론적 함의에 주목하여, 수행론적 관점에서 실천적 차원의 ‘중도’라는 점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으로는 『호조록』을 토대로 빨리본의 『인연 상윳따』와 한문본 『잡아함경』에서 대응되는 경을 비교·정리하고, 일부 내용은, 뜨리빠띠의 연구 결과인 산스끄리뜨본을 교차 검토하였다. 남전의 빨리본은 93개의 경이고, 북전의 한문본은 51개 경, 산스끄리뜨본은 25개경이다. 고락중도는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로서 팔정도가 제시된다. 한편, 연기설에는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에 대한 유무 중도, ‘단멸론과 상주론’의 양극단에 대한 단상중도, ‘목숨과 몸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일이중도,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인가? 남이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자작타작중도 등이 있다. 남전에서 고락중도는 ‘중도’로 표현되나, 나머지에는 ‘중[간에 의해서]’으로 표현된다. 남전의 연기설에서 주목한 점은 ‘바른 견해’가 제시된 ‘유무중도’로,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바른 수행의 토대이면서 수행을 통해 확립될 수 있다. 바른 견해는 칠청정으로 체계화되며, 이러한 칠청정은 위빳사나의 명상주제이기도 하다. 견해가 발생하는 과정은 우리의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과 동일하며, 위빳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바른 견해는 실현될 수 있다. 남전의 연기설에서 ‘중’은 수행론적 차원에서 ‘중도’로 볼 수 있으며, 위빳사나의 도움을 받아 통찰지 해탈에 대한 결실의 이익을 가져온다.
-
연기설에 나타난 ‘중도’에 대한 고찰
- 남북전의 비교를 통하여 -
-
투고논문
-
청정도론 중심의 상좌부 전통과 대승불교의 자애수행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actice of Mettā (Loving-kindness) in the Visuddhimagga-Centered Theravāda Tradition and Mahāyāna Buddhism
-
전지미
JEON, Ji-Mi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how mettā (loving-kindness), a core Buddhist practice, has been conceptualized and practically developed within the Theravāda commentarial …
본 연구는 불교의 핵심 수행인 자애(Metta)가 『청정도론』 중심의 상좌부 전통과 대승불교에서 각각 어떻게 개념화되고 실천적으로 전개되었는지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애 수행의 …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how mettā (loving-kindness), a core Buddhist practice, has been conceptualized and practically developed within the Theravāda commentarial tradition centered on the Visuddhimagga, as well as within Mahāyāna Buddhism. The research aims to re-illuminate the intrinsic value of mettā practice through this comparative examination.
Recently, mettā meditation has attracted widespread attention through Western psychology for its psychotherapeutic effects, including stress reduction and the cultivation of positive emotional states. However, an approach that focuses exclusively on these functional outcomes remains limited in that it fails to adequately reflect mettā’s original philosophical depth and its ethical and practical contexts.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overlook the ultimate goals of practice—liberation and nirvana—during the popularization of meditation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contemporary meditation scholarship. Within this context, the task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traditional foundations of mettā practice and its modern applications, while exploring the holistic meaning of practice grounded in fundamental Buddhist teaching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Through a textual analysis,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ravāda mettā practice, inheriting the tradition of Early Buddhism, was systematized as a structured “technique” for counteracting defilements, while already containing the latent seeds of altruistic “motive” and “wisdom.” Furthermore, the study illuminates the multi-layered developmental process within Mahāyāna Buddhism, in which mettā becomes integrated with karuṇā (compassion) and bodhicitta, and is sublimated into altruistic practices embodied in the “six pāramitās” grounded in the philosophy of śūnyatā (emptines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tradi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ettā practice deepens into an integrated framework of “technique, motive, and wisdom.” In response to the recent academic debate framed as “Practice: Transcendence or Healing?”, this analysis shows that transcendence and healing are not opposing concepts, but rather mutually complementary dimensions that must be organically integrated within the deepening process of practice. This framework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reaffirming the full context and depth of practice through the integration of mettā’s ultimate goal—liberation (transcendence)—and psychological stability (healing) as progressive and non-separate aim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suggesting that modern meditation programs can harmonize the intrinsic value of practice with contemporary applicability by restoring the organic integration of the Threefold Training (śīla, samādhi, paññā). By doing so, it contributes to articulating future directions for the training and formation of mettā meditation instructors.
- COLLAPSE
본 연구는 불교의 핵심 수행인 자애(Metta)가 『청정도론』 중심의 상좌부 전통과 대승불교에서 각각 어떻게 개념화되고 실천적으로 전개되었는지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애 수행의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자애명상이 서구 심리학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긍정 정서 함양 등 심리치료적 효과로 주목받으며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적 효과에만 치중한 접근은 자애 수행이 지닌 본래의 철학적 깊이 및 윤리적, 수행론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명상의 대중화 과정에서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과 열반의 가치가 간과되는 현상은 현대 명상 학계의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애 수행의 고유한 전통과 현대적 적용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한 수행의 전일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상좌부의 자애 수행이 초기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번뇌를 대치하는 체계적 ‘기술(Technique)’로 구체화 되었으며, 그 안에 이미 이타적 ‘동기(Motive)’와 ‘지혜(Wisdom)’의 맹아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분석한다. 나아가 대승불교에서 자애가 자비(Karunā) 및 보리심(Bodhicitta)과 결합하며, ‘공(空)’ 사상에 기반한 ‘육바라밀’이라는 이타적 실천으로 승화되는 다층적인 발전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러한 두 전통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애 수행이 ‘기술-동기-지혜’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로 심화됨을 입증한다. 이 분석은 최근 학계의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라는 논의에 응답하여, ‘초탈’과 ‘치유’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행의 심화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증명한다. 본 연구의 이 프레임워크는 자애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초탈)과 심리적 안정(치유)을 분리하지 않고 수행의 단계적 목표로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깊이를 재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대 명상 프로그램이 계·정·혜 삼학(三學)의 유기적 통합을 회복함으로써 수행의 본질적 가치와 현대적 실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자애 명상 지도자 양성의 미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청정도론 중심의 상좌부 전통과 대승불교의 자애수행 비교 연구
-
투고논문
-
『오온론』(Pañcaskandhaka)의 저자 귀속 문제
Is the Pañcaskandhaka Ascribable as the Real Work of Vasubandhu, the Author of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
이수진
LEE, Su-Jin
- This study examines the question of authorship of the Pañcaskandhaka (PSk). Although the PSk has traditionally been attributed to Vasubandhu, the author …
본 연구는 유식 문헌인 『오온론』(Pañcaskandhaka, 이하 PSk)의 저자 문제에 대한 검토이다. PSk는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 이하 AKBh)의 작자인 세친(Vasubandhu)의 작품에 …
- This study examines the question of authorship of the Pañcaskandhaka (PSk). Although the PSk has traditionally been attributed to Vasubandhu, the author of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AKBh), the hypothesis that there were two figures named Vasubandhu has raised doubts concerning the authorship of several works previously regarded as his.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whether the PSk was in fact composed by the same Vasubandhu who authored the AKBh.
Two major arguments are summarized in relation to this issue.
First, the discussion concerns the classification of mental factors (caitasika). The classification of mental factors in the PSk differs from that presented in the AKBh: whereas the AKBh enumerates forty-six mental factors, the PSk recognizes fifty-one. In the AKBh, Vasubandhu does not acknowledge these additional factors as distinct mental factors, on the grounds of their intrinsic nature. By contrast, in the PSk, this position is altered, and these factors are treated as separate entities.
Second, a further divergence appears in the definition of “sound” (śabda). In the AKBh, Vasubandhu explicitly refutes the classificatory taxonomy adopted in the PSk, referring to it as the position of “others” (apare). He criticizes this method of classification by pointing out that it involves a logical fallacy. Nevertheless, the PSk adopts precisely the classificatory system that the AKBh rejects, thereby revealing a serious inconsistency in doctrinal stance. This discrepancy casts substantial doubt on the assumption that the AKBh and the PSk were written by the same author.
The PSk should be regarded as an early Vijñānavāda text that incorporates key Vijñānavāda concepts on the basis of the Abhidharma doctrinal framework. Although it has traditionally been attributed to Vasubandhu, the author of the AKBh, a more careful reexamination of this attribution, together with further study of the text itself, appears to be necessary.
- COLLAPSE
본 연구는 유식 문헌인 『오온론』(Pañcaskandhaka, 이하 PSk)의 저자 문제에 대한 검토이다. PSk는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 이하 AKBh)의 작자인 세친(Vasubandhu)의 작품에 귀속해 있지만, ‘세친의 작품’이라는 권위를 제거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본 문헌의 불교사상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PSk를 구사론주 세친의 저작으로 볼 경우, AKBh에서 보이는 세친의 ‘경량부적 전제’가 PSk 상에서, 심불상응행(cittaviprayuktā-saṃskāra)을 실체적 존재[實有]가 아닌 단지 존재의 양태[avasthā, 分位], 즉 추상화된 개념[假有]으로 보는 점을 근거로 두 문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심불상응행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다른 유식 문헌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 양식으로, 정의의 유사성만으로 세친 사상이 전적으로 PSk에 반영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PSk에서는 AKBh와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심소(caitasika)의 분류에 있어, AKBh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 입각해 제외된 심소를 PSk에서는 별도의 개별 심소로 인정한다. 또 ‘믿음(śraddhā)’과 ‘소리(śabda)’의 정의에 있어, AKBh에서 이설(apare)로 다룬 정의를 PSk에서는 채용하고 있는데, 특히 PSk에서 제시하는 ‘소리’의 분류법은 세친이 AKBh에서 그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배제한 형식이다. 명백히 자신이 비판한 정의를 PSk에서는 오히려 채택하고 있다. 이 점은 AKBh와 PSk의 저자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PSk는 전통적인 아비달마 불교의 법체계를 토대로 유식의 주요 개념들이 접목된 초기 유식 계통의 문헌으로, 구사론주 세친에 귀속해 있지만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재검토 및 문헌 자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오온론』(Pañcaskandhaka)의 저자 귀속 문제
-
투고논문
-
긍정인가 부정인가
- 『능가경』 X.256-258 게송의 異讀과 Kamalaśīla의 유가행중관학파적 해석 -
Affirmation or Negation: Variant Readings of Laṅkāvatārasūtra X.256-258 and Kamalaśīla's Yogācāra-Madhyamaka Interpretation
-
차상엽
CHA, Sangyeob
- This study examines the variant readings among manuscript witnesses of the three cittamātra verses (X.256-258) in the Laṅkāvatārasūtra (hereafter LAS) and their …
본 연구는 『능가경』(Laṅkāvatārasūtra, 이하 LAS) 유심 3게송(X.256-258)의 이본(異本) 간 독법 차이와 그 사상적 함의를 Kamalaśīla의 『명상수행의 점진적 단계』(Bhāvanākrama) 첫 번째 편(이하 BhK …
- This study examines the variant readings among manuscript witnesses of the three cittamātra verses (X.256-258) in the Laṅkāvatārasūtra (hereafter LAS) and their philosophical implications, focusing on Kamalaśīla’s First Bhāvanākrama (hereafter BhK I).
Two distinct interpretative tendencies can be identified in the LAS cittamātra verses: (A) an “Affirmative tendency” (mahāyānaṃ sa paśyati, nirābhāsena paśyati) and (B) a “negative tendency” (mahāyānaṃ na paśyate, nirābhāse na paśyati). These differences arise from two grammatical issues: first, the choice between the pronoun sa and the negative particle na; and second, whether nirābhāsa is to be constructed in the locative case (nirābhāse), governing a negative construction (na paśyati), or in the instrumental case (nirābhāsena), governing an affirmative construction (paśyati). Despite the diversity of Nepalese manuscript paleography, the likelihood of confusion between sa and na is exceedingly low, suggesting that this variation reflects intentional divergence in textual transmission rather than mere scribal error. The “negative tendency” is widely attested in LASN, the majority of Nepalese manuscripts, two Chinese translations, and most Tibetan translations.
What merits particular attention, however, is the fact that Kamalaśīla explicitly cites the “affirmative tendency” in BhK I, rather than the more widely attested negative reading. This reading is consistently confirmed across the Sanskrit text of BhK I, the Dunhuang Tibetan manuscripts IOL Tib J 648 and PT 825, the Chinese translation, and various Tibetan versions. Kamalaśīla reinterprets this reading from a Yogācāra-Madhyamaka perspective, systematizing a gradual meditative progression: external realism → sākāravādayogācāra → nirākāravādayogācāra → advayajñāna → paramatattva, namely, non-conceptual yoga or samādhi. This progression represents a systematic development of contemplative praxis moving from Yogācāra toward Madhyamaka, and thus constitutes a meditation theory that practically actualizes the experience of emptiness as envisioned within Yogācāra-Madhyamaka.
Kamalaśīla’s hermeneutical strategy exemplifies what Paul Hacker and Lambert Schmithausen have defined as inclusivism, namely, the appropri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authoritative texts from antecedent tra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itimacy of one’s own philosophical position. In this case, Kamalaśīla strategically recontextualizes the LAS verses within a Yogācāra-Madhyamaka framework.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demonstrating that the variant readings of the LAS cittamātra verses extend beyond a merely philological issue. Rather, they illuminate how Yogācāra-Madhyamaka, as represented by Kamalaśīla, textually legitimizes and systematizes its distinctive philosophical position and meditation theory through deliberate and strategic textual interpretation.
- COLLAPSE
본 연구는 『능가경』(Laṅkāvatārasūtra, 이하 LAS) 유심 3게송(X.256-258)의 이본(異本) 간 독법 차이와 그 사상적 함의를 Kamalaśīla의 『명상수행의 점진적 단계』(Bhāvanākrama) 첫 번째 편(이하 BhK Ⅰ)을 중심으로 규명한다. LAS 유심 3게송은 크게 A. 긍정적 경향(mahāyānaṃ sa paśyati, nirābhāsena paśyati)과 B. 부정적 경향(mahāyānaṃ na paśyate, nirābhāse na paśyati)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독법 전통을 보인다. 이러한 독법 차이는 다음의 문법적 쟁점에서 비롯된다. 첫째, 대명사 sa와 부정사 na의 선택 문제, 둘째, nirābhāsa를 처격(Loc.) nirābhāse로 독해하여 부정 구문(na paśyati)을 취할 것인가, 혹은 도구격(Ins.) nirābhāsena로 독해하여 긍정 구문을 취할 것인가(paśyati)의 문제이다. 네팔 필사본 서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sa와 na의 혼동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는 단순한 전사 상의 오류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B. 부정적 경향은 다양한 LAS 네팔 필사본, 두 가지 한문 번역본, 대다수 티벳어 번역본, 그리고 LASN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Kamalaśīla가 BhK Ⅰ에서 A. 긍정적 경향을 명확히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BhK Ⅰ의 산스크리트어본, 돈황 출토 티벳어 필사본 IOL Tib J 648과 PT 825, 한문 번역본, 그리고 다양한 티벳어 번역본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다. Kamalaśīla는 이 독법을 유가행중관학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외부대상 실재론 → 유형상유식 → 무형상유식 → 무이지 → 최상의 진실, 즉 무분별 요가/삼매라는 점진적 명상 과정을 체계화한다. 이는 유식에서 중관으로 나아가는 관법(觀法)의 체계적 전개 과정으로서, 유가행중관학파가 지향하는 공성 체험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명상수행론에 해당한다. 까말라씰라의 이러한 해석 전략은 Paul Hacker와 Lambert Schmithausen이 정의한 포괄주의(inclusivism) 개념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자파의 철학적 입장에서 선행 전통의 권위 있는 텍스트를 재해석하여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유가행중관학파의 이론적·실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본 연구는 LAS 유심 3게송의 독법 차이가 단순한 문헌학적 문제를 넘어, 까말라씰라로 대표되는 유가행중관학파가 자파의 철학적 입장과 명상수행론을 어떻게 텍스트적으로 정당화하고 체계화하는지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긍정인가 부정인가
- 『능가경』 X.256-258 게송의 異讀과 Kamalaśīla의 유가행중관학파적 해석 -
-
투고논문
-
인도 논서(śāstra) 문헌군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문헌학적 개념들
- <진실의 집대성>(Tattvasaṃgraha) 속 참조정보의 데이터화 방안 -
Philological Concepts for Analyzing the Network of Śāstra Literature: A Schema for Datafication of Reference Information in the Tattvasaṃgraha
-
함형석
HAM, Hyoung-Seok
-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fining and thereby detecting reference information within Indian śāstra literature. It begins by reviewing the …
본고는 인도의 논서(śāstra) 문헌군에서 참조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석적 개념들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쁘라마나 문헌군의 …
-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fining and thereby detecting reference information within Indian śāstra literature. It begins by reviewing the philological system developed by Ernst Steinkellner and his collaborators to classify textual fragments that contain external references. Drawing upon Freschi and Maas’s discussion of “adaptive reuse,” the study argues that an explicit “act of referencing” within a śāstra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odes: 1. direct quotation, 2. quotation with minor editorial changes, 3. report, and 4. adaptation.
The paper proceeds to define “reference” as an act of attribution, discerning three necessary elements-the content (being referred to), object (or source of reference), and mode (of referencing)-that collectively constitute an attribution. An encoder who marks up reference information should search for these three fundamental elements of attribution to identify a textual fragment as an instance of explicit reference and to encode reference information systematically.
Following a discussion of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ree elements as they appear in Sanskrit literature, this paper proposes a schema for encoding referenc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I P5 Guidelines, using examples drawn from the Tattvasaṃgraha Encoding Project. Finally, it addresses the practical challenges involved in identifying each type of reference and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efficiency in the completion of large-scale text encoding projects.
- COLLAPSE
본고는 인도의 논서(śāstra) 문헌군에서 참조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석적 개념들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쁘라마나 문헌군의 참조정보를 다루기 위해 에른스트 슈타인켈너(Ernst Steinkellner)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온 문헌학적 시스템을 개관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 각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이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의와 비판을 반영하여 인도논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참조행위의 양상을 ‘인용’(quotation), ‘변형된 인용’(emendation), ‘각색된 재사용’(adaptation), 그리고 ‘보고’(reference)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인도 논서 문헌군에서 참조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석틀을 ‘귀속행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귀속행위’(attribution)란, 한 문헌의 저자가 일정 범위의 텍스트를 자신이 아닌 외부의 객체(인물, 서적 등)의 것이라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자는 귀속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귀속의 내용, 귀속의 대상, 그리고 귀속의 양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인도 논서 문헌에서 참조정보를 식별하고 그것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귀속행위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탐색해야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현재 진행중인 『진실의 집대성』(Tattvasaṃgraha와 그에 대한 pañjikā를 통칭) 인코딩 프로젝트를 위한 스키마를 정의하여 참조정보의 식별과 분류를 위한 문헌학적인 개념들을 TEI-XML형식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인도 논서(śāstra) 문헌군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문헌학적 개념들
- <진실의 집대성>(Tattvasaṃgraha) 속 참조정보의 데이터화 방안 -
-
투고논문
-
달력의 시간
- 돌뽀빠 쉐랍겔첸(Dol po pa Shes rab rgyal mtshan, 1292-1361)의 『제4결집(Bka' bsdu bzhi pa)』에서의 땐찌(bstan rtsis)의 초월적 의미 -
The Time of the Calendar: The Transcendent Meaning of the Calculation of the Doctrine (Bstan rtsis) in Dol po pa Shes rab rgyal mtshan’s (1292-1361) The Fourth Council (Bka' bsdu bzhi pa)
-
조석효
JO, Sokhyo
- The concept of bstan rtsis (the chronology and calculation of the doctrine), which is not clearly defined in Dol po pa Shes …
돌뽀빠 쉐랍겔첸의 『제4차 불전 결집의 의미[를 지닌]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계산』(Bka' bsdu bzhi pa'i don bstan rtsis chen po. 이하, …
- The concept of bstan rtsis (the chronology and calculation of the doctrine), which is not clearly defined in Dol po pa Shes rab rgyal mtshan’s work, The Great Calculation of the Teaching, which has the Significance of a Fourth Council (Bka' bsdu bzhi pa'i don bstan rtsis chen po, hereafter The Fourth Council), and his accompanying commentary, is a core concept presenting a framework for transcendent time in order to understand ultimate reality in terms of other emptiness (gzhan stong). This is achieved by uniting cosmological time and historical time through the medium of calendrical time. This framework operates as follows: First, the bstan rtsis calendarizes the cosmological time of the four yugas by specifying the year in which the Buddha taught the Kālacakratantra, even though this event is not supported by actual history. In this way, calendrical time functions as a tool and mediating device that introduces historical time, arranging specific events of Buddhist history within a cosmological schema. Furthermore, cosmological time provides an ontological foundation for this historical realm. In The Fourth Council, the four yugas and the timeless cosmic reality that is ultimate reality are clearly distinguished, with the latter being connected to other-emptiness. This structure in The Fourth Council, which is based on the Kālacakratantra, demonstrates how the construction of calendrical time via the bstan rtsis imparts philosophical and spiritual significance to the practitioner’s deep understanding of both the nature of time and the phenomenal world and, the ultimate reality of Buddha-nature (tathāgatagarbha) which is transcendence, or gzhan stong. In this way, the bstan rtsis, as the intersection point of time, history, cosmology and ultimate truth, is a key concept that clearly reveals Dol po pa’s unique insight into ultimate reality.
- COLLAPSE
돌뽀빠 쉐랍겔첸의 『제4차 불전 결집의 의미[를 지닌]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계산』(Bka' bsdu bzhi pa'i don bstan rtsis chen po. 이하, 『제4결집』)과 그 자주(自注)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땐찌(bstan rtsis, 가르침에 대한 계산)는 달력의 시간을 매개로 우주론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결합하여, 궁극적인 실재로서의 타공(gzhan stong) 이해를 위한 초월적 시간의 구도를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다음의 구도를 가진다. 먼저, 땐찌는 비록 실제 역사에서 지지되지는 않지만, 붓다가 깔라짜끄라딴뜨라(Kālacakratantra)를 설한 연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4유가(yuga)의 우주론적 시간을 달력화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의 시간은 특정 불교사적 사건들을 우주론적 도식 속에 배치하는 역사적 시간을 도입하는 도구이자 매개 장치이다. 여기에 더해, 우주론적 시간은 역사적 영역에 존재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제4결집』에서 4유가와 궁극적인 실재로서의 비시적(非時的) 실재, 곧 초월적·우주적 시간은 명확히 구분되고 후자는 타공과 연결지어진다. 깔라짜끄라딴뜨라에 근거하는 이러한 『제4결집』의 구조는 수행자가 시간 및 현상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여래장(tathāgatagarbha)이라는 궁극적 실재로서의 초월성 즉 타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땐찌를 통한 달력의 시간 구성이 어떻게 철학적·영적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시간, 역사, 우주론, 궁극적 진리가 교차하는 지점인 땐찌는 돌뽀빠가 제시한 궁극적 실재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명확히 드러내는 핵심 개념이다.
-
달력의 시간
- 돌뽀빠 쉐랍겔첸(Dol po pa Shes rab rgyal mtshan, 1292-1361)의 『제4결집(Bka' bsdu bzhi pa)』에서의 땐찌(bstan rtsis)의 초월적 의미 -
-
투고논문
-
조사의 삼관문
- 인간 존재의 의미: 삶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 -
The Patriarch’s Three Gates -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Life, Death, and Enlightenment -
-
허 진
HEU, Ji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ntions behind the use of the three gates of Seon - namely, Unmun-samgu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서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제시한 생사관을 고찰하고, 선종의 운문삼구, 황룡삼관, 도솔삼관을 중심으로 선사들이 삼관문을 어떠한 의도로 설정하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ntions behind the use of the three gates of Seon - namely, Unmun-samgu, Hwangyong-samgwan, and Dosol-samgwan- by Seon masters in their guidance of practitioners, and to explore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and relevance of these gates.
The content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f life and death has been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humanity since antiquity. When we consider the views on life and death held by four major thinkers from East and West, Confucius stated, “If you do not yet know life, how can you know death?” Zhuangzi taught that one should not cling to life and death, but rather live by entrusting oneself to the natural course of things. Socrates emphasized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the importance of caring for it, arguing that one should not fear death but instead live a life devoted to the cultivation of the soul. Nietzsche asserted, “Die at the right time—thus teaches Zarathustra.”
Second, within Seon Buddhism it is taught that liberation from life and death becomes possible through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and that the Three Gates function as one of several expedient means toward this end. In the Unmun Samgu, the Seon masters presented the three phrases of hamgaegeongon, jeoldan-jungnyu, and supachukrang; in the Hwangyong Samgwan, the three gates of “my hand and the Buddha’s hand,” “my foot and the donkey’s foot,” and “each person’s karmic conditions”; and in the Dosol Samgwan, the three gates of “the grass of ignorance,” “self-nature,” and “liberation from life and death.” Through these formulations, Seon masters provided their students with practical and experiential pathways toward enlightenment.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examined how Eastern and Western thinkers, together with Seon masters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Three Gates, understood and sought to transcend the problem of life and death. In particular, Seon masters approached this issue through perspectives and methods of practice fundamentally distinct from those of other religious or philosophical traditions.
- COLLAPSE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서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제시한 생사관을 고찰하고, 선종의 운문삼구, 황룡삼관, 도솔삼관을 중심으로 선사들이 삼관문을 어떠한 의도로 설정하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삼관문을 어떻게 투과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생사에 관한 문제는 유사 이래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였다. 동서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생사관을 살펴보면, 공자는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하였고, 장자는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에 내맡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성과 삶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고, 니체는 “제때에 죽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르치노라”라고 하였다. 둘째,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다양한 방편 중의 하나로써 삼관문을 사용하였다. 덕산 연밀은 운문삼구에서 함개건곤, 절단중류, 수파축랑이라는 삼구를, 황룡 혜남은 황룡삼관에서 나와 부처님의 손, 나와 당나귀의 발, 사람 각자의 인연이라는 삼관을, 도솔 종열은 도솔삼관에서 무명번뇌의 풀, 자성, 생사를 벗어남이라는 삼관을 각자 제시함으로써 학인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투과하도록 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동서 사상가들의 생사관과 선종 선사들의 삼관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생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초월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선종의 선사들은 기존의 종교나 사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수행 방식을 기반으로 삼관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생사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극복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
조사의 삼관문
- 인간 존재의 의미: 삶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 -
-
투고논문
-
『미륵상생경종요』의 10문(門) 구조 연구
- 원효의 미륵수행관을 중심으로 -
The Ten-Gate Structure (十門) of Wonhyo’s Jongyo (『宗要』)
-
송재민(향인) · 강은행
SONG, Jae-Min · KANG, Eun-Hang
- This paper investigates Wonhyo (元曉, 617–686)’s Mirŭk sangsaenggyŏng chong’yo (Essentials of the Sutra of Maitreya’s Ascension, hereafter Chong’yo) as …
본고는 분황 원효(芬皇元曉, 617-686)의 『미륵상생경종요』(이하 『종요』)를 수행관이 집약된 핵심 텍스트로 보고, 그 의도와 특징을 10문(門) 구조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
- This paper investigates Wonhyo (元曉, 617–686)’s Mirŭk sangsaenggyŏng chong’yo (Essentials of the Sutra of Maitreya’s Ascension, hereafter Chong’yo) as a core text that encapsulates his view of Buddhist practice, with the aim of elucidating its authorial intention and distinctive features through an analysis of its ten-gate (十門) structure.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primarily on interpreting the ideological content of the Chong’yo from the perspectives of hwajaeng (和諍, reconciliation of disputes) or yusim (唯心, mind-only), this study instead directs attention to the text’s structural purposiveness, particularly the rationale underlying Wonhyo’s deliberate sequencing of ten questions.
The ten gates of the Chong’yo are 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uccessive stages of doubt that a practitioner encounters along the path of religious pursuit. In Gates 3 through 8, the process of “refuting the heterodox” (破邪, pasa) unfolds through the systematic rebuttal of various doubts, while Gates 9 and 10 advance toward the stage of “revealing the orthodox” (顯正, hyeonjeong) through the logic of original ground and manifested traces (本迹, bonjeok). The conceptual foundation enabling this progression is established in Chapter II, specifically in the sections titled “Great Meaning” (大意) and “Doctrinal Tenet” (宗致), where the goal of practice and the rational principle of “two practices and four fruits” (二行四果) are articulated, thereby providing the orienting framework for the entire text.
In conclusion, the ten-gate structure of the Chong’yo may be understood as a practical guide that leads practitioners toward a form of “wise faith” (智信, jisin), which is established through rigorous intellectual inquiry and the systematic overcoming of doubt, rather than through blind belief. By reexamining the Chong’yo not merely as a doctrinal exposition but as a structurally designed text that carefully maps the practitioner’s experiential journey, this study newly illuminates the originality and coherence of Wonhyo’s view of practice.
- COLLAPSE
본고는 분황 원효(芬皇元曉, 617-686)의 『미륵상생경종요』(이하 『종요』)를 수행관이 집약된 핵심 텍스트로 보고, 그 의도와 특징을 10문(門) 구조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종요』의 사상적 ‘내용’을 화쟁(和諍)이나 유심(唯心) 관점에서 해석했다면, 본고는 왜 원효가 열 가지 질문의 순서를 설정했는지, 곧 텍스트의 구조적 목적성에 주목한다. 『종요』의 10문은 수행자가 구도의 여정에서 차례로 마주하게 되는 의심의 단계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제3~8문에서는 다양한 의혹을 하나씩 논박하며 ‘파사(破邪)’의 과정을 거치고, 제9~10문에서는 본적(本迹)의 논리를 통해 ‘현정(顯正)’의 경지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토대가 바로 제Ⅱ장의 「대의(大意)」와 「종치(宗致)」로, 여기에서 수행의 목표와 ‘2행 4과’라는 합리적 원리가 제시되어 전체 전개의 이정표를 마련한다. 결론적으로 『종요』의 10문 구조는 맹목적 신앙을 넘어 철저한 지적 탐구와 의심의 극복을 통해 성립하는 ‘지혜로운 믿음(智信)’을 이끌어내는 수행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요』를 단순한 교리 해설서가 아닌, 수행자의 실제 여정을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적 텍스트로 재조명함으로써 원효 수행관의 독창성을 새롭게 드러낸다.
-
『미륵상생경종요』의 10문(門) 구조 연구
- 원효의 미륵수행관을 중심으로 -
-
투고논문
-
백파 긍선과 추사 김정희의 선리(禪理) 논쟁 재고
- 「백파망증15조」를 중심으로 -
Reconsidering the Zen Doctrinal Controversy between Baekpa Geungseon and Chusa Kim Jeong-hui: Focusing on the 'Fifteen Articles on Baekpa's Delusions
-
서성숙
SUH, Sung-Sook
- This study re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husa (秋思) Kim Jeong-hui (金正喜)’s critique of Baekpa Geungseon (白坡亘璇)’s Zen doctrine as articulated in Baekpa-Mangzeung15jo …
본 연구는 추사 김정희의 「백파망증15조(白坡妄證十五條)」에서 백파 긍선에게 가한 신랄한 선리 비판의 의미를 재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두 인물 간의 불교관 …
- This study re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husa (秋思) Kim Jeong-hui (金正喜)’s critique of Baekpa Geungseon (白坡亘璇)’s Zen doctrine as articulated in Baekpa-Mangzeung15jo (namely, Fiteen articles on deslusions of Baekpa).
Rather than interpreting this critique as an expression of personal antagonism or as a simple instance of interreligious conflict, the study situates it within the broader intellectual and doctrinal tensions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in late Joseon Korea.
The analysis first examines Kim Jeong-hui’s intellectual formation through his exchanges with Choui Uisun, whose thought played a decisive role in shaping Chusa’s understanding of Zen principles. It then reviews Baekpa’s Seonmun Sugyeong and Choui’s Seonmun Sabyeon Manyeo, which together constituted the immediate textual and doctrinal background of the Zen controversy. On this basis, the study analyzes Chusa’s conception of Zen as revealed in Fifteen Articles on the Delusions of Baekpa.
This study engages with prior scholarship, by drawing on Lee Jong-ik’s analysis of Kim Jeong-hui’s Buddhist thought, Geum Jang-tae’s examination of Kim’s perception of Buddhism and debates on Zen learning, and Kim Yong-tae’s comprehensive account of Joseon Buddhist intellectual history. These works provide essential historical and doctrinal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controvers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Chusa, grounded in Neo-Confucian theoretical reasoning, criticized Baekpa’s Zen learning by targeting its doctrinal foundations and modes of practice, whereas Baekpa emphasized experiential awakening and intuitive cultivation as central to Zen realization.
Despite this confrontation, Chusa later expressed scholarly respect for Baekpa by commemorating him as a master of Vinaya learning in a posthumous stele inscrip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ir debate reveals a dialectical tension between theory-centered critique and practice-oriented interpretation, thereby illuminating the complexity of Zen discourse in late Joseon intellectual history.
- COLLAPSE
본 연구는 추사 김정희의 「백파망증15조(白坡妄證十五條)」에서 백파 긍선에게 가한 신랄한 선리 비판의 의미를 재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두 인물 간의 불교관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조선후기 사상계에 깊게 천착했던 유불의 교리적 긴장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추사와 백파 간 선리 논쟁의 발단이 된 백파의 『선문수경』과 이를 비판한 초의의 『선문사변만어』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백파망증15조」에 드러난 추사의 선관을 고찰할 것이다. 본고는 연구사 검토를 위해 이종익의 「證答白坡書를 통해 본 김추사의 불교관」, 금장태의 「김정희의 불교인식과 선학논변」, 김용태의 『조선 불교사상사』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백파에 대한 추사의 선리 비판은 단순히 종교 간 대립이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전개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사는 성리학의 이론적 체계에 입각하여 선리의교학적 기반과 수행론을 비판하였으며, 특히 백파의 선학 이해와 실참(實參) 방법론을 직접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백파는 체험적 깨달음과 직관적 수증(修證)의 우위성을 내세우며, 추사의 경전 해석학에 치중한 성리학적 선리(禪理) 접근법에 대해 선문 본래의 실수행론적 관점에서 반박하였다. 이 같은 사상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추사는 백파 타계 후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를 통해 그를 율학의 대가로 추숭하며 학자적 경의를 표했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백파의 실참론적 선리 해석과 추사의 이론 비판적 접근법 간의 변증법적 대립 구조를 「백파망증15조」에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조선후기 선리 논쟁의 양상이 현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상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백파 긍선과 추사 김정희의 선리(禪理) 논쟁 재고
- 「백파망증15조」를 중심으로 -
-
투고논문
-
쿠차의 이야기형 천불도와 그 사상적 맥락
- 복합적 불교 전통의 시각화 -
Narrative Thousand Buddha Paintings of Kucha and Their Religious Backgrounds: Visualization of the Multi-Layered Buddhist Traditions
-
이지호
YI, Ji Ho
-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m in Kucha through an in-depth examination of narrative Thousand Buddha paintings found in the region’s …
본 연구는 쿠차 지역 석굴사원에 그려진 이야기형 천불도(千佛圖)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쿠차 불교의 복합적·다층적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쿠차는 실크로드 천산북로(天山北路)의 요충지로서 인도와 중국 …
-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m in Kucha through an in-depth examination of narrative Thousand Buddha paintings found in the region’s rock-cut cave temples. Situated along the Northern Silk Road, Kucha functioned as a crucial nexus for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between India and China. Unlike conventional Thousand Buddha paintings, which primarily consist of the repetitive arrangement of the identical Buddha images, the narrative type identified in Kumtura Caves 50, 29, and 34, as well as Kizil Cave 227, depicts specific scenes in which bodhisattvas make offerings to the Buddha, who in turn bestows predictions (vyākaraṇa) of future buddhahood.
These paintings are integrated with images of Amitābha’s Pure Land (Kumtura Cave 50), various spirit deities (Kumtura Cave 34), the City of Nirvāṇa (Kumtura Caves 29 and 50), and pretas in hell (Kizil Cave 227), and thus function as more than mere decoration; rather, they serve as visual manifestations of the multifaceted devotional and doctrinal landscape of Kucha Buddhism. Kumtura Cave 34 and Cave 50 are situated at some distance from other caves and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small-scale worship spaces, suggesting that caves adorned with narrative Thousand Buddha imagery were recognized as distinctive sites of devotion in their own right.
After surveying Kucha’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analyzing the architectural and iconographic features of these cav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such visual programs reflect the complex and syncretic nature of Buddhist belief and practice in Kucha. By focusing on this distinctive visual mode, the study offers new insights into the ways Kucha Buddhism integrated elements from multiple Buddhist traditions, thereby illuminating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dynamics of Buddhism in this historically strategic and cosmopolitan center.
- COLLAPSE
본 연구는 쿠차 지역 석굴사원에 그려진 이야기형 천불도(千佛圖)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쿠차 불교의 복합적·다층적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쿠차는 실크로드 천산북로(天山北路)의 요충지로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불교 전파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전통적인 천불도가 동일한 불상 형상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야기형 천불도는 보살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가 그 보살에게 미래불(未來佛)이 될 것을 수기(授記)하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열과 행을 달리하여 반복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형 천불도는 쿰투라 석굴 제29·34·50굴과 키질 석굴 제227굴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쿰투라 석굴 제50굴), 다양한 천신의 도상(쿰투라 석굴 제34굴), 열반성(쿰투라 석굴 제29·50굴), 지옥의 아귀(키질 석굴 227굴) 등 기타 도상과 동반하여 각 석굴을 독특한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들 석굴 벽화는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쿠차 불교의 다층적 신앙과 교리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쿰투라 제34굴과 제50굴은 다른 석굴들과 다소 분리된 위치에 조성되어 독립적인 소형 예배공간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이야기형 천불도를 장식한 석굴이 그 자체로 특별한 예배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먼저 쿠차의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개관하고, 이어 해당 석굴의 건축적 구조와 도상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시각적 프로그램이 쿠차 불교의 복합적이고 혼융적인 신앙 양상을 반영함을 밝힌다. 이를 통해 쿠차 불교가 다양한 불교 전통의 요소를 수용·통합하였음을 규명하고, 나아가 실크로드 불교문화의 사상적·문화적 역동성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
쿠차의 이야기형 천불도와 그 사상적 맥락
- 복합적 불교 전통의 시각화 -
-
투고논문
-
의역어 무량수(無量壽)에서 음역어 아미타(阿彌陀)로
- 불상 명문 속 존명 변화의 함의 -
Rethinking the Epithet Shift from Muryangsu to Amitā in Buddhist Statue Inscriptions
-
정진영
CHUNG, Jin-Young
-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to the transition in Amitābha Buddha’s epithet from Muryangsu (Immeasurable Life, 無量壽) to Amitā (阿彌陀), from the …
본 연구는 아미타불의 이름이 6세기 후반 북제~수대를 기점으로 당대에 이르기까지 ‘무량수’에서 ‘아미타’로 전환된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단일 …
-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to the transition in Amitābha Buddha’s epithet from Muryangsu (Immeasurable Life, 無量壽) to Amitā (阿彌陀), from the late Northern Qi–Sui period through the Tang dynasty. As with many shifts in Buddhist nomenclature, this change is unlikely to have resulted from a single cause; rather, it appears to have emerg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multiple factors. Accordingly, this paper considers three possible explanations. First, as the Amitābha faith developed and its functions and symbolic meanings expanded, the more comprehensive epithet Amitā may have come to be preferred. Second, as observed in other cases of Buddhist nomenclature, the choices made by translators during the process of scriptural translation, as well as the subsequent influence of particular scriptures, may have contributed to this shift. Third, the widespread diffusion of chengming nianfo (稱名念佛), the practice of repeatedly reciting “Namo Amitābha,” may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consolidating the use of Amitā.
Among these factors, this study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the third, namely the influence of chengming nianfo. Because chengming nianfo centers on the repetitive vocalization of Amitābha’s name, its popularization would naturally have shaped both the perception and reception of the epithet. The preference for the Sanskrit-based phonetic form Amitā can further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a broader Chinese Buddhist conviction concerning the sacredness, efficacy, and quasi-magical power of Sanskrit sounds. In dhāraṇī and mantra traditions, semantic translation was deliberately avoided in order to preserve ritual potency, and the retention of original sounds was regarded as essential. In this respect, chengming nianfo, as a repetitive oral practice oriented toward resonance, response, and salvific efficacy, wa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dhāraṇī recitation. Within such a religious milieu, the gradual replacement of the semantic translation Muryangsu with the phonetic transcription Amitā—shorter, easier to pronounce, and believed to retain ritual efficacy—can be understood as a natural historical development.
- COLLAPSE
본 연구는 아미타불의 이름이 6세기 후반 북제~수대를 기점으로 당대에 이르기까지 ‘무량수’에서 ‘아미타’로 전환된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단일 요인보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며,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존명 변화의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아미타 신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가 확장되면서 보다 포괄적 개념을 지닌 ‘아미타’가 선호되었을 가능성, 둘째, 역경 과정에서 번역자의 선택 및 해당 경전의 영향력이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 셋째,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염송하는 칭명염불의 확산이 존명 전환을 실질적으로 공고히 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세 번째 요인인 칭명염불의 파급력에 주목하였다. 칭명염불은 신앙 실천의 기저에서 아미타불 명호의 반복적 염송을 중심에 두고 있었으며, 그 확산은 자연스럽게 ‘아미타’에 대한 인식과 수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나아가 칭명염불 수행에서 ‘아미타’라는 원어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중국 불교 전반에 만연해 있던 산스크리트 원음에 대한 신성성·영험함·주술적 효력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라니·만트라는 그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 번역을 지양하고 원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떻게 보면 칭명염불 역시 구술적 행위의 반복성과 감응·가피를 기대하는 수행이라는 점에서 다라니 독송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발음하기 쉽고 간결하며 동시에 주술적 신성함을 담보한다고 여겨진 음역어 ‘아미타’가 의역어 ‘무량수’를 점차 대체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의역어 무량수(無量壽)에서 음역어 아미타(阿彌陀)로
- 불상 명문 속 존명 변화의 함의 -
-
투고논문
-
호모 인드라네티우스
- 거주 가능성 확장을 위한 대안적 인간관 -
Homo indranetius: An Alternative View of Humanity That Expands the Possibility of Habitability
-
박병기
PAK, Byung-Kee
- Coexistence and harmony have now become central concerns of our time and society. In the modern context, where individuals premised on isolation …
공존과 화합은 이제 우리 시대와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고립성과 이기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을 주체로 설정한 근대 이후의 상황 속에서 사회는 그 …
- Coexistence and harmony have now become central concerns of our time and society. In the modern context, where individuals premised on isolation and self-interest were established as primary subjects, society tended to be understood through contract theory as the product of agreements designed to secure the interests of those individuals. Korean society, which began to adopt these conceptions of the human and the social more fully through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following the June Uprising of 1987 that ended military dictatorship, has likewise become familiar with this perspective. However, as these notions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were increasingly reduced to the economic human model of Homo economicus, they contributed to a crisis of coexistence and harmony, symbolized most acutely by contemporary ecological crises.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Homo indranetius as a model of humanity positioned as the subject of efforts to expand habitability. Homo indranetius is a practical being who not only perceives the self, society, the world, and the universe through the lens of networks, but also extends this perspective into practice through the will and capacity to confront and overcome crises threatening habitability. As an alternative view of humanity, Homo indranetius draws on the Hwaeom metaphor of Indra’s net to grasp the reality of existing beings, while also demonstrating affinity with the actor-as-network proposition emphasized in actor-network theory. This concept highlights that for anything to exist, it must secure dependent co-arising with other beings, and that such dependence constitutes the very condition enabling mutual existence. At the same time, each bead retains its own dignity and singularity (獨存) precisely by shining distinctly and thereby reflecting all other beads. The addition of the term homo serves only as a heuristic to emphasize the responsibility borne by human beings as a species. In other words, the responsibility for overcoming the fundamental destructiveness of modern civilization, which emerged with the rise of individualized subjects, rests uniquely with human beings who are capable of self-awareness and of assuming responsibility for action through the exercise of a certain degree of free will. If this alternative image of humanity can be shared, it is anticipated that such a shared perspective may be extended into a practical response to the crisis of habitability faced not only by humanity but by all beings.
- COLLAPSE
공존과 화합은 이제 우리 시대와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고립성과 이기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을 주체로 설정한 근대 이후의 상황 속에서 사회는 그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계약의 산물이라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1987년 군부독재 종식을 가져온 6월 항쟁을 계기로 정착한 시민사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런 관점에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개인과 사회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경제적 인간상으로 축소되면서 생태 위기를 상징으로 하는 공존과 화합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대응하여 거주 가능성의 확장을 위한 노력의 주체로서 인간상을 우리는 ‘호모 인드라네티우스(homo indranetius)’로 설정해볼 수 있다. 그는 연결망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사회, 세계, 우주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거주 가능성에 초래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토대로 실천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존재자이다. 대안적 인간관으로서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화엄의 인드라망 비유를 활용하는 인간상이고,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강조하는 연결망으로서 행위자라는 명제와도 친화성을 지닌다. 무엇이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자들과의 연기적 의존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의존성이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자의 구슬은 영롱하게 빛남으로써만 다른 모든 구슬들을 비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존엄성과 독존성(獨存性)을 보장받는다. 그 앞에 호모(homo)를 덧붙인 것은 인간 존재와 종(種)이 지니는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개별화된 주체로 등장하여 도달한 근대 이후의 문명이 지닌 근원적인 파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스스로를 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유의지도 확보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만의 것이라는 고유성에 주목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 대안적 인간상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 공유되는 시각을 중심으로 삼아 인류는 물론 모든 존재자들의 거주 가능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호모 인드라네티우스
- 거주 가능성 확장을 위한 대안적 인간관 -
-
투고논문
-
포괄적 정의와 본래적 정의로 보는 청정의 심리학
- 육근청정과 자성청정을 중심으로 -
The Psychology of Purification Viewed from Comprehensive and Essential Definitions: Focusing on the Purification of the Six Sense Faculties and Intrinsic Purification
-
윤희조
YOUN, Hee-Jo
-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psychology of purification within Buddhism. Etymologically, purification refers to a calm and …
본고는 불교에서 청정의 심리학의 정립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어원적 의미에서 청정은 괴로움이 없는 평안하고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다. 청정의 유개념은 경안으로 볼 수 …
-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psychology of purification within Buddhism. Etymologically, purification refers to a calm and untainted state that is free from suffering. A related conceptual notion is ease or serenity, and on the basis of this relationship, purification may be defined as “a state in which the body and mind become light and peaceful through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thought in accordance with truth”.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purification can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domain, sequence, and occur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domain, purification consists of the conjunction of wholesome and indeterminate mental factors, and it encompasses the realm of non-volitional dharmas and non-defiled volitional dharmas. It corresponds to the truth of cessation and the truth of path, and includes both transcendental purification and mundane purification. According to classifications in Western psychology, purification corresponds to beneficial forms of cognition, emotion, motivation, behavior, and personality within the field of basic psych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equence, purification may be understood through the stages of the seven purification and four purification, the sequential structure of threefold training in morality, concentration, and wisdom, the stages of the five dharmic attainments - morality, concentration, wisdom, liberation, and knowledge of liberation - and the five stages of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occurrence, purification may be observed in the purification of the six sense faculties, the purification of the three karmic activities, the purification of the three wheels of action (body, speech, and mind), and the purification of the six sense entrances. The six sense faculties, the three karmas, the three wheels, and the six entrances may be understood as the loci in which purification arises. Within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the characteristics of purification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ir contrast with the defining features of defilements.
The essential definition of purification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 of intrinsic purification, which may be regarded as the fundamental basis underlying all forms of purificatio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ultimate aims of Buddhism - nirvana, non-self, emptiness, non-duality, suchness, Buddha-nature, and own-nature - the defining features of purification in its essential sense can be identified.
- COLLAPSE
본고는 불교에서 청정의 심리학의 정립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어원적 의미에서 청정은 괴로움이 없는 평안하고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다. 청정의 유개념은 경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정을 ‘이치에 맞게 마음씀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청정의 포괄적 정의는 영역, 차제, 발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영역의 관점에서 청정은 선과 무부무기를 합한 것이고, 무위법와 무루유위법의 영역이고, 멸성제와 도성제에 해당하고, 출세간 청정과 세간 청정이다. 서구심리학의 분류에 의하면 기초심리학 가운데 유익한 인지, 정서, 동기, 행동, 성격심리학에 해당한다. 차제의 관점에서 청정은 칠청정과 사청정의 차제로 볼 수 있고, 계정혜 삼학의 차제, 오법온의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차제, 오위의 차제로 볼 수 있다. 발생의 관점에서 육근청정, 삼업청정, 삼륜청정, 육입청정을 볼 수 있다. 육근, 삼업, 삼륜, 육입은 청정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정의에서 청정의 특징은 번뇌의 특징의 대치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청정의 본래적 정의는 자성청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자성청정은 모든 청정의 근본 토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궁극목표인 열반, 무아, 공, 불이, 진여, 불성, 자성이 가지는 특징을 통해서 본래적 정의에서 청정의 특징을 볼 수 있다.
-
포괄적 정의와 본래적 정의로 보는 청정의 심리학
- 육근청정과 자성청정을 중심으로 -
-
투고논문
-
감정의 유동성
- 현대 구성주의 감정이론과 초기불교 연기론을 중심으로 -
The Fluidity of Emotion: A Comparative Study of Contemporary Constructivist Emotion Theory and Early Buddhist Dependent Arising
-
박정아
PARK, Jung-A
- Treating emotion as something that inherently “exists” tends to fix it as an unavoidable inner reality and thereby keeps individuals under its …
감정이 본래 ‘있는 것’이라는 전제는 감정을 피할 수 없는 내적 실재로 고정시키고, 우리를 감정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감정을 조건과 맥락에 …
- Treating emotion as something that inherently “exists” tends to fix it as an unavoidable inner reality and thereby keeps individuals under its influence. By contrast, when emotion is understood as a process constituted through conditions and context, emotional experience can be reconsidered not as a necessity but as something transformabl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motional essentialism and argues for the fluidity of emo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temporary constructivist theories of emotion and the early Buddhist doctrine of dependent arising (paṭiccasamuppāda).
Within constructivist accounts, emotion is constituted when the brain’s real-time processes of prediction and conceptualization render ongoing affective states meaningful through conceptual knowledge and linguistic categories, thereby forming specific emotion categories. The apparent sameness or continuity of emotion is stabilized through repeated categorization and the recurrent application of emotion concepts, a process often described as naming. Early Buddhism, by contrast, presents emotion as an impermanent phenomenon that arises, changes, and ceases within networks of dependent conditions. In Pāli sources, affective experience is described as a conditioned flow in which phassa, vedanā, saññā, saṅkhāra, and viññāṇa operate in mutual dependence; when representational processes, linguistic naming, and hypothetical designation converge, experience is discriminated and recognized as a particular emotion. The aggregate of formations (saṅkhāra-khandha) functions as a background condition within cognition, suggesting how patterned repetition can sustain and reinforce the appearance of emotional identity over time.
Both traditions thus understand emotion not as a fixed essence but as a constituted process shaped through categorization and naming, forming a significant point of convergence. Nevertheless, they diverge in emphasis: constructivist approaches focus on the possibility of emotional change through socio-cultural learning and the reconfiguration of conceptual systems, whereas early Buddhism identifies the appropriation of emotion as “I” and “mine” as the central problem that intensifies clinging and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dismantling such identification. On this basis, the present study proposes emotion as a fluid mode of experience that arises and changes through conditions, interpretation, and conceptual categorization, thereby extending a non-reductionist and non-essentialist framework within which affective practice and ethical reflection may be grounded.
- COLLAPSE
감정이 본래 ‘있는 것’이라는 전제는 감정을 피할 수 없는 내적 실재로 고정시키고, 우리를 감정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감정을 조건과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감정 경험은 필연이 아니라, 전환 가능한 현상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을 본질적 실체로 가정해 온 본질주의의 한계를 검토하고, 현대 구성주의 감정이론과 초기불교 연기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감정의 유동성을 논증한다. 현대 구성주의 감정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뇌의 예측과 개념화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정동 상태가 개념적 지식과 언어적 범주를 통해 의미화될 때 특정한 감정 범주로 구성된다. 이때, 감정의 동일성은 범주화와 감정 개념의 반복적 적용(naming)을 통해 성립한다. 한편, 초기불교는 감정을 연기적 조건 속에서 성립·변화·소멸하는 무상한 현상으로 제시한다. 빨리 문헌에서 감정적 경험은 접촉·느낌·지각·형성력·의식이 상호 의존하는 조건 속에서 전개되는 흐름이며, 지각에 따른 표상과 언어적 명명 및 가설적 지칭이 결합할 때, 비로소 특정 감정으로 분별 되어 드러난다. 특히 행온은 인식 과정의 배경 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감정 경험의 반복적 동일성이 유지·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전통은 감정을 고정된 본질이 아닌 조건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감정이 식별·명명·지칭 등 개념적 처리에 의해 조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점을 이룬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감정을 사회·문화적 학습과 개념 체계의 재구성을 통해 변화 가능성의 해명에 초점을 둔다면, 초기불교는 감정이 ‘나와 내 것’으로 동일시될 때 취착이 강화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삼고, 이를 해체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감정을 경험 내부의 고유한 성질로 환원하지 않고, 조건·해석·개념적 범주에 의해 성립하고 변화하는 유동적 경험 양식으로 제시한다. 이는 감정을 비환원적·비본질적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정서적 실천과 윤리적 성찰이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
감정의 유동성
- 현대 구성주의 감정이론과 초기불교 연기론을 중심으로 -
-
투고논문
-
경계 너머의 자비
- 자기와 타자의 통합을 향한 불교적 고찰 -
Compassion Beyond Boundaries: A Buddhist Inquiry into the Integration of Self and Other
-
권선아
GWON, Seona
-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iscourse on self-compassion developed in contemporary psychology through the lens of the Buddhist structure of compassion (karuṇā) …
본 연구는 현대 심리학에서 발전한 자기 자비(Self-Compassion) 담론을 불교 전통의 자비(Karuṇā) 수행 구조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양자의 구조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
-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iscourse on self-compassion developed in contemporary psychology through the lens of the Buddhist structure of compassion (karuṇā) practice and proposes a nondual integrative model that seeks to address the structural tensions between the two. The difference between self-compassion and Buddhist compassion does not lie merely in variations of scope or target, but rather in more fundamental divergences concer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self and the structure of contemplative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conceptualizes compassion as a relational and contemplative phenomenon that emerges prior to the distinction between self and other, and it explores how compassion practice enables a transformation in habitual modes of perceiving self and others as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In contemporary psychology, self-compassion is generally grounded in an individualistic and non-relational conception of the self and is primarily understood as a mechanism of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recovery. In contrast, within the Buddhist tradition, compassion is understood as a practice integrated with wisdom, through which self-centered modes of perception are transcended and the interdependent nature of relational existence is disclosed. The primary analytical frameworks of this study for exploring this contrast are Bhikkhu Anālayo’s articulation of the expansive structure of immeasurable compassion, John Dunne’s analysis of insight into emptiness, Jordan Quaglia’s integrative model of compassion, and John Makransky’s Sustainable Compassion Training (SCT). Ultimately, this study reframes compassion as a relational and nondual contemplative practice that mediates between Buddhist contemplative traditions and contemporary compassion science, extending compassion beyond the level of a psychological skill toward a pathway of ontological transformation and highlighting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 COLLAPSE
본 연구는 현대 심리학에서 발전한 자기 자비(Self-Compassion) 담론을 불교 전통의 자비(Karuṇā) 수행 구조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양자의 구조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비이원적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기 자비와 불교적 자비의 차이는 단순히 적용 범위나 대상의 구분에 있지 않고, 자아 이해와 수행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비를 ‘자기’와 ‘타자’의 구분 이전에 관계 속에서 수행을 통해 드러나는 경험으로 파악하고, 자비 수행을 통해 자기와 타자를 분리된 실체로 인식해 온 인식 구조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탐구한다. 현대 심리학의 자기 자비 개념은 개인적이고 비관계적인 자아관을 전제로 하여 자비를 주로 내면의 정서 조절과 심리적 회복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불교 전통의 자비는 지혜와 결합된 수행으로서, 자아 중심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 상호 연기적 관계성을 드러내는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날라요(Anālayo)의 무한 자비 확산 구조, 존 던(John Dunne)의 공성 통찰, 조던 콸리아(Jordan Quaglia)의 통합 자비 모델, 그리고 존 마크란스키(John Makransky)의 지속 가능한 자비 수행(Sustainable Compassion Training, SCT)을 주요 분석 틀로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자비를 관계적이고 비이원적인 수행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불교 수행 전통과 현대 자비 과학 사이의 구조적 간극을 매개하는 통합적 지평을 제시하고, 자비를 심리적 기술의 수준을 넘어 존재론적 전환의 길로 확장하는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제시한다.
-
경계 너머의 자비
- 자기와 타자의 통합을 향한 불교적 고찰 -
-
특별논문
-
Pebbles Slipping through the Sieve: Wrong Livelihood, Wrong Trades and Unwholesome Gifts
사명(邪命), 부정한 매매, 부적절한 보시에 관한 불교윤리적 관점 - 상좌부 불교 윤리의 다중 여과 체계에 대한 고찰 -
-
Ven. PANDITA (Burma)
빤디따 스님
- In this paper, I first closely look at the notion of right or wrong livelihood (ājīva), and show that it has never …
본 논문은 상좌부(Theravāda) 문헌에 대한 심층적 독해를 통해 불교 윤리에서 정명(正命)과 사명(邪命)의 개념을 재검토한다. 불교 도덕은 근본적으로 의도(cetanā)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윤리적 계율은 …
- In this paper, I first closely look at the notion of right or wrong livelihood (ājīva), and show that it has never been clearly understood in Theravādin tradition, and also that this misunderstanding has adversely affected both traditional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Buddhist ethics. To solve this issue, I propose the theory of multiple sieves as an interpretive framework for Buddhist ethics. Although Buddhist moral evaluation ultimately depends on intention (cetanā), ethical precepts are formulated primarily in terms of bodily and verbal actions. This methodological feature results in moral categories that are inevitably imprecise, allowing certain ethically problematic activities to escape judgment at one level while being restricted at another. Buddhist ethics is therefore best understood as a system of multiple, hierarchically arranged moral filters.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Five, Eight, and Ten Precepts, together with the Vinaya, to demonstrate how increasingly refined moral frameworks regulate activities permitted at more basic levels. On this basis, it argues that right livelihood functions as a secondary moral sieve, capturing forms of livelihood that may not constitute explicit violations of right action or right speech. The same analytical model is applied to the canonical lists of five wrong trades and five unwholesome gifts, explaining why these practices are prohibited despite not necessarily violating fundamental precepts such as non-killing or basic religious practices such as generosity. By situating these doctrines within a unified ethical structure, the paper offers a coherent reading of Theravāda sources and resolves interpretive tensions that have influenced both traditional and modern discussions of Buddhist moral theory.
- COLLAPSE
본 논문은 상좌부(Theravāda) 문헌에 대한 심층적 독해를 통해 불교 윤리에서 정명(正命)과 사명(邪命)의 개념을 재검토한다. 불교 도덕은 근본적으로 의도(cetanā)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윤리적 계율은 주로 신체적·언어적 행위의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생계, 교역, 보시와 관련된 논의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데이미언 키온(Damien Keown)의 목록 중심적 해석, 곧 경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업만을 사명(邪命)으로 간주하려는 주장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불교의 윤리적 규정을 개별적인 규칙, 곧 ‘구조화된 체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체계’를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다중적인 도덕적 체(multiple moral sieves)’라는 비유를 제안한다. 오계(五戒)는 명백한 도덕적 위반을 걸러내는 ‘성긴 체(액체를 거르는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명(正命), 다섯 가지 부정한 매매[五邪命], 부적절한 보시, 율장(Vinaya)의 규정과 같은 것은 ‘이차적 체(액체를 거르는 기구)’에 해당하는데, 이는 앞 단계의 ‘체(액체를 거르는 기구)’를 통과한 윤리적 문제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정명(正命)은 독립적인 도덕 원칙이 아니고, ‘이차적 체(액체를 거르는 기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정명(正命)은 명시적인 신체적·언어적 범계(犯戒)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 체’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사명(邪命), 사악한 교역, 부적절한 보시의 윤리적 역할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경전 목록에 대해 문자주의적인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군 복무나 억제력(deterrence)과 같은 논쟁적인 사례에 대해 더욱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상좌부 불교 윤리의 생계 문제를 둘러싼 오랜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
Pebbles Slipping through the Sieve: Wrong Livelihood, Wrong Trades and Unwholesome Gifts
Journal Informai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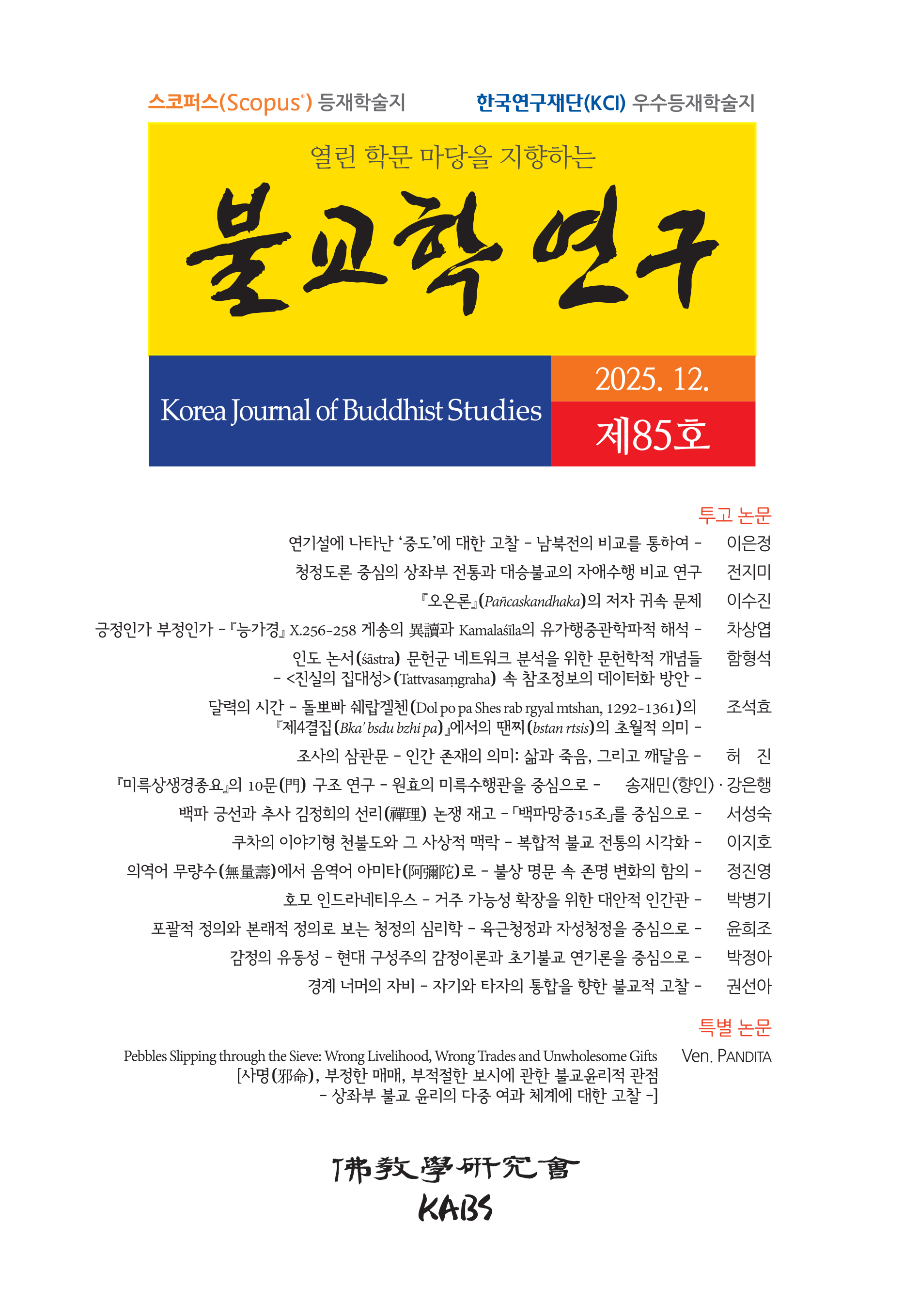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Journal Informaiton
Journal Informaiton - cl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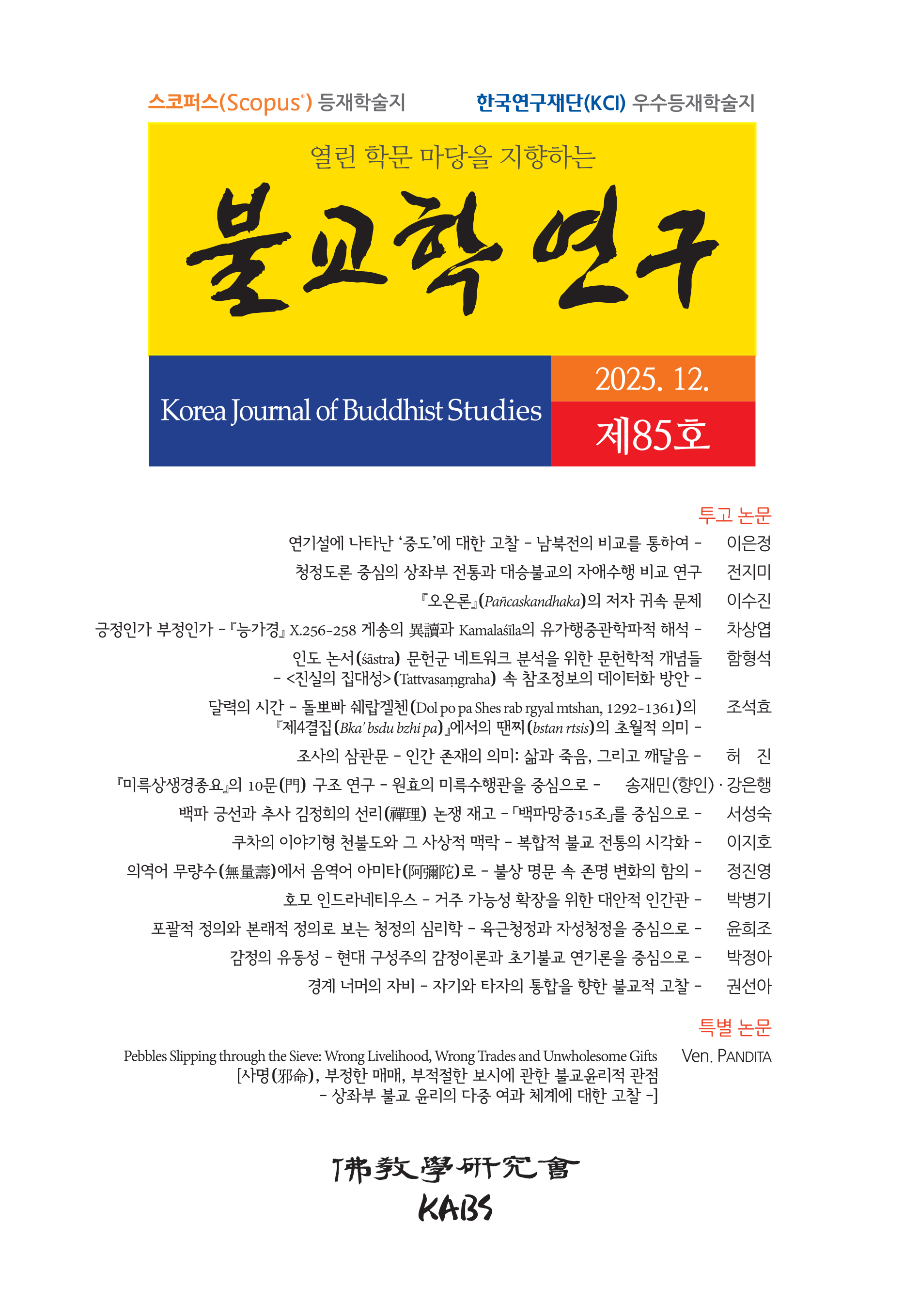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